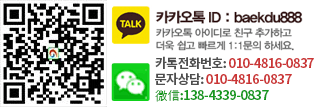경제소득 높아지니 민권의식 높아지는 중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1-04 02:48본문
2012년 새해 첫날, 중국 허난(河南)성 안양(安陽)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지만 웨이보(微博)를 통하여 시위현장이 거의 시시각각으로 전파되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약 3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3만 명’이 모이는 것이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 중국에서 몇 천, 몇 만 명이 모이는 일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벌어진다. 조그만 교통사고 하나만 발생하여도 어디서 알고 몰려들었는지 갑자기 수백 명이 현장을 빙 둘러싸는 것을 보면 ‘역시 인구가 많긴 많구나’하고 새삼 느끼게 된다.
이번에 안양 시위의 원인 비법집자(非法集资)에 있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불법 사설펀드 정도가 되겠다. 금융업에 대한 단속이 심하다보니 곳곳에서 사설펀드나 대부업체가 활개치고 있는데, 허난성 촌동네 사람들의 손때 묻은 돈을 꿀꺽 삼킨 ‘먹튀’ 일당들이 많았나보다. 피해액이 자그마치 400억 인민폐에 이른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 규모를 믿지를 못하겠다. 하여간 평생 모아둔 돈을 졸지에 잃어버린 촌부들이 중앙정부에 하소연을 하겠다고 안양역 인근에 집결하여 상경(上京)투쟁을 계획하였던 것인데, 경찰이 역사를 원천봉쇄하여 당일 베이징(北京)행 열차가 모두 취소되었다고 한다.
◆ ‘나무지키기’ 시위까지 벌어진 2011년, 중국
언론을 통해 흔히 보도되지는 않지만 중국에도 수많은 시위가 발생한다. 필자 개인적으로 그러한 동향에 관심이 많아 기사를 발견할 때마다 스크랩해 두었는데, 지난해에만 30여건을 수집하였다. 시위배경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고, 한국과 같이 전문적인 시위꾼들에 의해 계획된 시위보다는 자생적이고 우발적인 시위가 대부분이다.
경제적인 시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기름값이 폭등하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들의 시위가 저장(浙江)성과 광둥(广东)성, 푸젠(福建)성 몇 개 도시에서 연달아 일어났고, 강제이전에 대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도 저장, 광둥성 일대에서 계속되었다. 토지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광동성의 우칸(烏坎)촌이라는 시골마을 주민들이 100여 일에 가까운 장기항전(?) 끝에 중국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는 보기 드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들이 자치조직을 꾸리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단전 단수 조치 등에서 아랑곳 않고 버텨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중국 사람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제법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는 랴오닝(辽宁)성 다롄(大连) 시민 1만 여명이 화학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장쑤(江苏)성에서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의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주보상 문제로 인한 시위, 전지공장으로 인한 납중독 환자 발생에 항의하는 시위, 심지어는 도심 가로수 철거에 항의하는 ‘나무지키기’ 시위와 중학생들의 급식비 인상 반대 시위까지 있었다.
경제적인 동기가 민족문제와 겹쳐지면서 사태가 확산된 대표적인 예로는, 외신에도 알려진 네이멍구(内蒙古) 유목민들의 탄광 개발 반대 시위가 있었고, 산시(陕西)성에서 도시 청관(城管)이 소수민족 노점상을 거칠게 단속한 것이 민족 문제로 번지기도 하였다. 한국으로 말하면 구청의 ‘노점단속반’이나 ‘환경정비원’ 정도에 해당할 청관은 올해에도 중국 곳곳에서 말썽의 씨앗이 되었다. 임산부 노점상을 폭행하여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장애인 노점상을 목졸라 살해하여 시위를 자극하거나, 비인권적인 단속 현장이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면서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중국에서 시위를 줄이려면 중국 지도부가 청관 단속부터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다.
◆ ‘민주화의 역설’을 기억하여야
중국도 사람 사는 곳이니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극구 덮어두려 애쓸 필요도 없다. 중국 정부는 2005년까지는 <사회청서(社会蓝皮书)>를 통해 시위발생 건수를 공개하곤 했는데, 지난 몇 년간은 공식적인 통계치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한 해에 몇 십만 건이 발생한다’는 억측까지 생겨나고 있다. 한반도의 약 43배, 남한의 96배에 달하는 땅에서 하루에도 몇십, 혹은 몇백 건 정도의 시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터이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 시위양상에서 두드러진 점은, 첫째 경제발전과 개발의 과정에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과거에 비해 시위가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외부에 쉽게 전파가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말 타결된 우칸촌의 시위처럼, 이제 중국 주민들은 “정부에서 개발하는 것이니 항변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예전처럼 쉽게 체념하지 않는다. 받아내야 할 것은 끝까지 받아내고, 뭉쳐서 요구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 비슷한 것을 얻어가는 듯하다.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널리, 얼마나 빨리 중국 대륙에 확산될 것인지가 관건이며, 중국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새해 첫날 허난성의 시위처럼, 이슈를 지역에 묻어두지 않고 중앙정부를 향하여 전국화하려는 것도 최근 시위의 경향이다. ‘여론의 힘’을 중국 주민들이 알아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이 이러한 변화를 급속히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각종 시위의 진원지가 대부분 저장, 광둥, 푸젠성 지역인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곳 주민들이 다른 지방 사람들에 비해 유독 반골(反骨)경향이 드세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크게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화의 역설’이 중국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시위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60~70년대가 아니라 ‘어느정도 먹고 살만해졌던’ 80년대에 중산층까지 끌어들이며 폭발하였던 사실을 중국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길 바란다.
이번에 안양 시위의 원인 비법집자(非法集资)에 있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불법 사설펀드 정도가 되겠다. 금융업에 대한 단속이 심하다보니 곳곳에서 사설펀드나 대부업체가 활개치고 있는데, 허난성 촌동네 사람들의 손때 묻은 돈을 꿀꺽 삼킨 ‘먹튀’ 일당들이 많았나보다. 피해액이 자그마치 400억 인민폐에 이른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 규모를 믿지를 못하겠다. 하여간 평생 모아둔 돈을 졸지에 잃어버린 촌부들이 중앙정부에 하소연을 하겠다고 안양역 인근에 집결하여 상경(上京)투쟁을 계획하였던 것인데, 경찰이 역사를 원천봉쇄하여 당일 베이징(北京)행 열차가 모두 취소되었다고 한다.
◆ ‘나무지키기’ 시위까지 벌어진 2011년, 중국
언론을 통해 흔히 보도되지는 않지만 중국에도 수많은 시위가 발생한다. 필자 개인적으로 그러한 동향에 관심이 많아 기사를 발견할 때마다 스크랩해 두었는데, 지난해에만 30여건을 수집하였다. 시위배경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고, 한국과 같이 전문적인 시위꾼들에 의해 계획된 시위보다는 자생적이고 우발적인 시위가 대부분이다.
경제적인 시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기름값이 폭등하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들의 시위가 저장(浙江)성과 광둥(广东)성, 푸젠(福建)성 몇 개 도시에서 연달아 일어났고, 강제이전에 대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도 저장, 광둥성 일대에서 계속되었다. 토지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광동성의 우칸(烏坎)촌이라는 시골마을 주민들이 100여 일에 가까운 장기항전(?) 끝에 중국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는 보기 드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들이 자치조직을 꾸리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단전 단수 조치 등에서 아랑곳 않고 버텨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중국 사람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제법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는 랴오닝(辽宁)성 다롄(大连) 시민 1만 여명이 화학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장쑤(江苏)성에서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의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주보상 문제로 인한 시위, 전지공장으로 인한 납중독 환자 발생에 항의하는 시위, 심지어는 도심 가로수 철거에 항의하는 ‘나무지키기’ 시위와 중학생들의 급식비 인상 반대 시위까지 있었다.
경제적인 동기가 민족문제와 겹쳐지면서 사태가 확산된 대표적인 예로는, 외신에도 알려진 네이멍구(内蒙古) 유목민들의 탄광 개발 반대 시위가 있었고, 산시(陕西)성에서 도시 청관(城管)이 소수민족 노점상을 거칠게 단속한 것이 민족 문제로 번지기도 하였다. 한국으로 말하면 구청의 ‘노점단속반’이나 ‘환경정비원’ 정도에 해당할 청관은 올해에도 중국 곳곳에서 말썽의 씨앗이 되었다. 임산부 노점상을 폭행하여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장애인 노점상을 목졸라 살해하여 시위를 자극하거나, 비인권적인 단속 현장이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면서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중국에서 시위를 줄이려면 중국 지도부가 청관 단속부터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다.
◆ ‘민주화의 역설’을 기억하여야
중국도 사람 사는 곳이니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극구 덮어두려 애쓸 필요도 없다. 중국 정부는 2005년까지는 <사회청서(社会蓝皮书)>를 통해 시위발생 건수를 공개하곤 했는데, 지난 몇 년간은 공식적인 통계치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한 해에 몇 십만 건이 발생한다’는 억측까지 생겨나고 있다. 한반도의 약 43배, 남한의 96배에 달하는 땅에서 하루에도 몇십, 혹은 몇백 건 정도의 시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터이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 시위양상에서 두드러진 점은, 첫째 경제발전과 개발의 과정에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과거에 비해 시위가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외부에 쉽게 전파가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말 타결된 우칸촌의 시위처럼, 이제 중국 주민들은 “정부에서 개발하는 것이니 항변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예전처럼 쉽게 체념하지 않는다. 받아내야 할 것은 끝까지 받아내고, 뭉쳐서 요구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 비슷한 것을 얻어가는 듯하다.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널리, 얼마나 빨리 중국 대륙에 확산될 것인지가 관건이며, 중국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새해 첫날 허난성의 시위처럼, 이슈를 지역에 묻어두지 않고 중앙정부를 향하여 전국화하려는 것도 최근 시위의 경향이다. ‘여론의 힘’을 중국 주민들이 알아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이 이러한 변화를 급속히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각종 시위의 진원지가 대부분 저장, 광둥, 푸젠성 지역인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곳 주민들이 다른 지방 사람들에 비해 유독 반골(反骨)경향이 드세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크게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화의 역설’이 중국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시위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60~70년대가 아니라 ‘어느정도 먹고 살만해졌던’ 80년대에 중산층까지 끌어들이며 폭발하였던 사실을 중국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길 바란다.



 PC 버전으로 보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