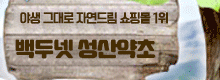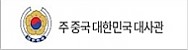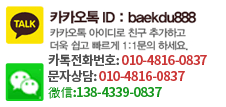우리 력사 바로 알고 삽시다(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철호| 작성일 :12-11-18 06:47|본문
월 강 곡
이 땅에 정착하게 되는 민족의 전주곡
애달픔 맺혀있는 겨레의 슬픈 노래
1
겨울 두만강은 꽁꽁 얼어붙어있다. 눈보라가 아츠란 비명을 지르면서 눈덮인 강우에서 란무한다. 두만강언제에서 바라보는 사이섬은 무척 황페해 보인다. 뒤돌아보니 멀리 룡정시개산툰화학섬유팔프공장의 굴뚝이며 천평벌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촌락들의 하얀 지붕이 바라보인다. 자그마한 호수를 지척에 두고있는 선구촌 제6촌민소조가 바로 턱밑이다.
월편에 나붓기는 갈대잎 가지는
애타는 내 가슴을 불러야 보건만
이 몸이 건느면 월강죄란다
이 언제에 서서 사이섬이며 촌락들을 바라볼 때마다 떠오르는 “월강곡”이다. 애처로운 “월강곡”노래소리가 눈보라에 실려와 귀전을 울려주는것만 같다.
“월강곡”은 이 땅에 정착하게 되는 우리 민족의 전주곡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북쪽을 우러러 탄식하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넜던가.
항간에서는 게걸스레 먹는 아이를 보면 “기사년에 난 애같다”고들 한다. 1860년부터 1870년까지의 11년간 조선 북부에서는 대한재와 대충재가 련이어 들었다. 특히 1869년 기사년(己巳年)에 함경도의 무산, 회령, 종성, 온성, 경흥 등 6진에 덮쳐든 한재는 유사이래 겪어보지 못했던 특대 한재였다.
해동머리부터 가물이 시작되였는데 여름이 다 가도록 비 한방울 오지 않았으니 전대미문의 왕가물이 아닐수 없었다. 조선 리조왕조의 부패한 관리배들의 학정으로 풍년이 들었다해도 굶주림에 시달리려야 하는 백성들이였는데 왕가물까지 겹쳤으니 살길이 꽉 막혀버리고만것이다. 굶주린 사람들은 산나물, 들나물을 캐먹었고 산열매를 따먹었다. 나무도 열매도 없어지자 그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껍지를 벗겨먹었다. 집집에 굶어죽고 얼어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였다.
길가에는 임자없는 시체가 나뒹굴기도 했다. 어떤 부락에서는 배고픈걸 견디다못해 등에 업었던 자식을 잡아먹는 참상까지 벌러졌다고 한다. 그때의 참상을 《이야기 중국조선족력사》(박청산, 김철수 저) 일서에서 이렇게 절규하고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굶어죽었으면 이 해를 ‘굶어죽은 해(飢死年)’라고까지 불렀겠는가.”
사실 두만강을 건너는것은 북도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길이 되고말았다. 그러나 이 길마저 순순히 열리는 것은 아니였다. 조선 리조조정에서는 강안에 숱한 포막을 세우고 월강을 엄금시켰으며 월강하다 잡힌자들을 “월강죄”로 마구 목을 따버렸다.
2
한편 청나라 통치자들은 도읍을 심양에서 북경으로 옮긴후 장백산이북의 천리땅을 《룡흥지지》 즉 만족의 발상지로 만들고 엄한 봉금을 실시하면서 이민들의 이주를 일률로 금지했다. 이것이 바로 력사에서 말하는 “봉금령”이다. “봉금령”이 내려진후 만주땅은 천부지토로 되고말았다.
무연한 황무지, 끝없는 삼림, 무진장한 자연자원이 깊이 잠들고있었다. 연변땅은 청나라 팔기병들의 훈렬장소로 인삼과 진주를 캐고 사슴과 수달피 등 진귀동물을 잡아 청나라 통치자들에게 바치는 수렵장소로 되고말았다. 만족을 내놓고 이민족이 들어오는 경우 추방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잘못 걸리면 목을 잘리웠다.
장백산지구는 이렇게 인가가 없는 황량한 곳으로 200여년 비여있게 되었다. 무성한 삼림, 비옥한 땅은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너무나 충분하였다. “앉아서 굶어죽으면 어떻고 월강하다 잡혀 죽으면 어떠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인데 강을 건너고 보자. 혹 성공하면 살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비밀리에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대형다큐멘터리 《연변아리랑》(허봉학, 리광수 저)의 독백장면이다.
처음에는 일귀경작(日歸耕作)하는걸로 그쳤다. 야밤에 두만강을 건너와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는 아침이면 돌아갔다. 후에는 며칠씩 묵박혀 있으면서 농사짓기도 했다. 청나라관청의 령이 엄하면 돌아오고 뜸해지면 또 들어가는 방법으로 두만강북안기슭에서 농사를 지었다. 어떤 사람들은 두만강연안 순라선에서 좀 멀찍히 떨어진 산골짜기에 숨어들어가 나무를 베고 부대밭을 일구어 곡식을 심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봄에 월강하여 깊숙히 들어와서는 농사를 짓고는 가을이면 타작한 곡식을 등에 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주 집을 짓고 살림을 차리는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목숨을 내건 일들이였다. 그러다가 잡히면 엄벌을 받는데 두만강기슭에서 사람을 죽여 목을 걸어놓고 효시하는 장면을 언제든지 볼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고향에 남아있는 안해들은 남편들 때문에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는지 모른다. 어느날 불현듯 두만강가의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남편의 머리를 발견하고 기절하여 쓰러진 녀인들이 얼마였으랴. “월강곡”에는 이러한 애달픈 심정이 련련히 맺혀있다.
기러기 갈 때마다 일러야 보내며
꿈길에 그대와는 늘 같이 다녀도
이 몸이 거너면 월강죄란다
류연산의 장편기행문 《혈연의 강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재되여 있다. 1883년 서북경략사 어윤중(西北經略使 魚允中)은 함경북도를 순찰하던 도중 종성의 수항루에 올라 두만강대안을 바라보다가 산발에 오불꼬불 뻗어있는 오솔길을 발견하고 “저건 무슨 길인고?”하고 물었다.
“백성들은 저승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나이다.”종성부사의 대답이였다.
“저승길이라니?”
“이곳 날놀사군들이 강을 건너서 골짜기에 들어가 부대를 일구면서부터 난 길이옵나이다. 월강죄는 목을 친다고 했으니 저승길이 아니겠나이까?”종성부사의 이실직고였다.
크게 깨달은 어윤중은 월강금지령을 페지하고 “월강죄인 불가진살(越江罪人 不可塵殺)”이라고 하면서 월강자들에게 지권을 주어 강북으로의 이주를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길림장군 명안과 오대징은 연변지방에서 이미 다수를 차지한 조선족을 출국시킬수 없고 개간한 토지를 황무지로 만들수도 없다면서 집조를 발급할것을 주장했다.
결국 청나라 조정에서는 로씨야의 침략 등 국내외 복잡한 정세속에서 조선이주민을 리용하여 연변을 개간하기로 하고 1885년에 봉금령을 페지하였다. 이로부터 변강주민들은 더는 “월강곡”을 애태게 부르지 않아도 되었다.
3
월강무죄의 령이 각 부락에 제때에 전해지지 못해 월강죄로 아쉽게 죽어간 마지막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무산의 사포수였다. 그때의 장면을 작가 류연산씨는 장편기행문 《혈연의 강들》에서 이렇게 묘사하고있다.
월강사냥을 한 사실이 탄로가 나서 관가에 잡힌 사포수는 달구지에 앉아 두만강변사형장으로 떠났다. 국경한계가 없이 자유로이 넘나드는 짐승이야 국적이 있으랴만 사람이 강을 건넜다는 리유 하나로도 당시엔 사형판결이 쉽게 떨어질수 있었으리.
수인차를 끄는 둥굴소는 울퉁불퉁한 길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암소처럼 대소변 때문에 멈추는 시간랑비도 없이 슬슬 잘도 끌고간다.
강변사형장의 단두대 량옆엔 벌써 명을 받고 온 도부수들이 름름히 대기하고있었다. 도부수들의 손에 들린 선들선들한 큰 칼을 보자 사포수는 진작 혼백이 구중천으로 날아올랐다. 수인차가 사형장에 이르기 바쁘게 사령들은 결박한 사형수를 끄집어 내려 꿇어앉히고 단두대에 머리를 얹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고을쪽으로부터 말 한필이 쏜살같이 달려왔다. 말등에 앉은 파발군은 손을 휘저으며 뭐라고 소리를 쳤는데 거리가 멀어서 무슨 소리인지 가려 들을수가 없었다.
판결문을 읽고나자 도부수들은 칼을 허공에 들었다가 힘껏 내리찍었다. 목이 두동강이 나면서 뻘건 피가 분수처럼 쏴-솟아 사방에 휘뿌려졌다.
“사형을 정지히시오! 월강죄 불문에 붙이라는 어명이요!”
파발군이 들이닥치며 바쁜 소리를 쳤다. 모두들 아연해졌다. 하지만 어명은 행차뒤의 나발이였다. 사포수의 시체는 꿈지락거리다가 굳어졌다. 목에서 떨어져나간 머리와 싸늘히 식어가는 몸둥이는 마치도 커다란 웨침표마냥 모래사장에 뉘여졌다.
그것은 “월강죄”에 대한 종지부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