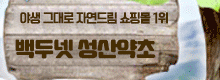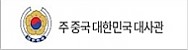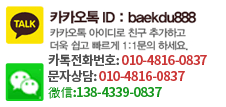인재가 없으면 중국도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10-24 10:01|본문
Part 1 - 캐나다에 살고 싶다는 칭화대 신입생
린린(淋淋), 올해 나이 열아홉. 온바오에 실린 김정권 포스코건설 전 사장의 칼럼을 보고 혼자서 가을을 만끽해보려고 올라탄 옌칭(延庆)행 S2열차 안에서 그녀를 만났다. 땅콩 한 봉지에 캔맥주 3개를 꺼내놓고 한가롭게 앉아 출발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 아리따운 아가씨가 “옆자리에 사람 있어요?”라고 묻는 게 아닌가. 당연히(!) 자리를 내줬다.
중국 명문 칭화(清华)대학교의 신입생이라고 했다. 고향은 산동(山东)성 지난(济南).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의사란다. 묻지도 않았는데 신상을 털어놓는다. 불현듯 경계심이 앞섰다. 실은, 대화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열차가 출발하자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만의 주말여행을 한참을 자랑했는데, 낯선 이방어로 조잘대다가 자세를 바로잡는 내 얼굴을 슬쩍 흘겨보더니 “외국인이세요?”라고 묻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니 참 인연이라고, 대학생이 된 후에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인데 옆 자리에 외국인이 앉다니 참말로 인연이라고, 그 말을 시발탄으로 한 시간 가량 약간은 어색하면서도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다.
그냥 전형적인 중국의 구링허우(90后 ; 1990년대 이후 출생자)였다. 휴대폰을 2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폰이었고, 다른 하나는 좀 낡았긴 했지만 막 출시되었을 때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모델이었다. 모두 엄마가 사줬다고 했다. 옷차림이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옷을 단정하게 잘 갖춰입은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풍겼고, 목소리에는 아직 철부지의 억양이 느껴졌으며, 눈빛은 반짝반짝 호기심으로 빛났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았으리라. 스스로 말하길 “집안의 보배로 자랐다”고 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칭화대에 입학하게 되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해보지 않았다나. 단 한 번도 일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은근히 자랑질이다.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대답이 의외였다.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단다.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으니, 그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단다. 캐나다나 북유럽과 같이 겨울이 길고 청량한 나라를 동경한단다.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으니 중학시절 단짝이 동방신기를 무척이나 좋아하여 자신은 ‘한국 = 동방신기’라는 이미지만 각인되어 있다고 했다. 그녀는 나보다 한 정거장 앞인 빠다링(八达岭)역에서 내렸다. 자유롭게 세계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며 청춘의 꿈을 펼칠 ‘자유로운 영혼’의 앞날에 축복의 인사를 건넸다.
Part 2 - “중국에 인재는 많지만 상상력은 없다.”
내가 아는 한 선배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던지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반드시 찾아가 본다고 했다. 관광지 같은 곳은 거의 찾아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여행 가이드북의 사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다며, 특이하게도 꼭 대학에 들른단다. 대학을 둘러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점 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내 학창시절에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말이 참 부럽게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지나친 학벌주의를 개탄하며 ‘서울대의 나라’라고 탓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그 나라 최고의 상아탑을 살펴보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최고 명문대학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뒤집어보면 그 나라의 20~30년 후 미래가 보인다. 국가 상위 1~2%에 들어가는 천재들이 노상 쉽게 돈 벌 궁리나 하고 있고 철밥통이나 끌어안을 요령이나 부리고 있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나라에서 장학금 주며 영재라고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유학 가서 선진국 시민권이나 딸 생각이나 한다면 그야말로 ‘죽 쒀서 뭐 주는 꼴’이다.
중국의 미래도 우선 ‘대학’에서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중국 최고의 지성들이 어떠한 꿈과 이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미래는 어쩌면 암울하다.
광둥(广东)성에서 발행되는 신주간(新周刊)이라는 잡지사가 올해 8월 창간 15주년을 맞아 ‘중국에게 따져 묻는다(追问中)’하는 제목의 특집판을 냈는데, 거기에 있는 ‘중국은 무엇이 부족한가?(中国缺什么?)’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중국에 A는 충분하다, 그러나 B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14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중국에 ‘중국제조’는 많지만 ‘중국창조’는 없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중에 “중국에 ‘인재’는 많지만 ‘상상력’은 없다”라는 말도 중국 스스로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다.
중국에 각 국가별로 상회(商会)가 조직되어 자기나라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상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건의서’의 2011년판에 보니 이런 대목이 나온다. 중국에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부탁인즉, 제발(!)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라는 주문이다. 오죽했으면 외국인 경제단체에서 중국 정부에 제출하는 건의서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겠는가 싶어 씁쓸한 생각마저 들었다.
Part 3 - “그러면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군요”
중국에 천인계획(千人计划)이라는 것이 있다. 해외에 있는 우수한 인재 1,000명을 중국으로 끌어들여 중국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식 명칭은 ‘해외고급인재영입계획(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이다. 화교들 가운데 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고급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중국에 정착하면 곧장 1차로 인민폐 100만 위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택과 일자리 제공 등 각종 우대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실제 적잖은 인재들이 그에 화답해 서방의 교수나 연구원직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달려왔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에 세계 언론이 ‘중국이 자원 블랙홀에서 인재 블랙홀로 변신하려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어찌보면 ‘천인계획’이란 그만큼 중국이 인재난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갖가지 물질적 유혹이 자유국가의 인재들에게 과연 ‘미끼’가 될 수 있을런지, 그것이 의문이다.
인재들은 왜 중국을 떠나는 것일까? 급여가 작아서? 생활환경이 척박해서? 후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굳이 ‘천인계획’ 같은 것을 내놓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무섭게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당장 급하니까 외국에서 인재를 빨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토양에서 어떻게 중국의 인재를 만들어 낼 것인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리라.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중국에 과연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라고 개탄한다. 누구보다 중국을 아끼고 중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중국의 인재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유명한 일화가 있다. 1978년 덩샤오핑(邓小平)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도 한국의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고 일본의 철강인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부탁받은 사람이 난색을 표하며 “제철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 것”이라면서 “한국에는 박태준 같은 사람이 있어 제철소를 지었지만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지 않느냐”고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그러자 덩샤오핑 왈. “그러면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군요.”
덩샤오핑의 유쾌한 농담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뭐든지 돈만 주면 사버릴 수 있다는 중국인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말”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재다. 한순간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인재가 놀 수 있는 활기찬 ‘마당’이 없으면 결국 인재는 둔재(鈍才)가 된다.
Part 4 - 제2, 제3의 첸쉐션이 태어나려면……
남의 나라 걱정도 좋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되돌아볼 일이다.
2009년 이맘때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책상 위에 놓인 중국신문 1면의 큰 머릿기사가 눈에 띄었다. 첸쉐션(钱学森)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첸쉐션이 누구더라? 혁명원로인가, 해서 보았더니 중국의 과학자이다. 과학자 한 명이 타계했다고 1면에 대문짝만하게, 그것도 신문의 서너 면을 통째로 할애하여 특집기사를 실은 것을 보고 가벼운 충격을 받았다. 물론 첸쉐션은 일반(?) 과학자는 아니고 미사일을 전공한, 일종의 군수 과학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망에 대한 특집기사는 중국 정부의 보도지시도 한 몫을 거들었을 것이다.
첸쉐션의 사망 이후 ‘오성홍기 바람에 휘날리며(五星红旗迎风飘扬)’라는 드라마가 장장 40부작으로 중국중앙텔레비젼(CC-TV)를 통해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그 또한 작은 부러움을 느꼈다. 중국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던, 1960년대 중후반의 이른바 양탄일성(两弹一星)의 쾌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드라마 서두에 주제가와 함께 그 업적에 기여한 20여명의 과학자들의 사진이 흘러가는 화면이 매번 인상적이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의 이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는 얼마나 과학자를 우대하고 존경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역시나 암담하다. 학창시절 줄곧 1-2등을 놓치지 않았을 인재들이 한의학과나 경찰대 같은 곳을 가장 선호하는 현상을 보면 (그렇다고 이런 직업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이 올바른 걸까’하는 걱정 또한 든다.
오는 31일은 첸쉐션 사망 2주기이다. 추모행사가 있을 것이다. 신중국 수립 이후 중국공산당은 줄곧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라고 노래하며 중국 인민들의 뇌리에 공식 아닌 공식을 들이밀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삼 깨달아야 한다. 인재가 없으면, 지식인이 없으면, 중국도 없다. 지금 중국 사회와 교육의 토양에서 제2, 제3의 첸쉐션이 나타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때이다. 한국 또한 두 말 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