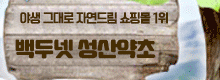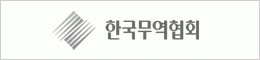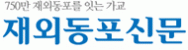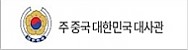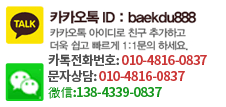고대산문의 발전과정(고대문학)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 :11-08-11 08:43|본문
중국 고대문학은 이른바 정통문학이라는 시와 산문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줄곧 정통문학의 지위를 차지해 온 산문은 ≪서경(書經)≫에서 시작됐다.
≪서경≫은 역사가들이 쓴 요순(堯舜)시대로부터 주대(周代)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기록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는 점은 고대산문의 중요한 전통이다. 이러한 전통은 공자가 쓴 춘추시대의 역사서 ≪춘추(春秋)≫와 다시 이를 자세히 풀이한 ≪좌전(左傳)≫으로 이어졌다. 또 뒤이어 나온 ≪국어(國語)≫나 ≪전국책(戰國策)≫, 그리고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등등이 모두 역사 기록이라는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한 산문의 정화이다.
한편 공자의 사상을 담은 ≪논어(論語)≫와 장자의 철학을 담은 ≪장자(莊子)≫를 비롯하여 제자백가의 많은 서적들이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씌어졌으며 ≪역경(易經)≫ 같은 철학서도 출현한다. 이들은 모두 사상적·철학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후 산문 저작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통이 됐다.
위에서 본 역사나 사상·철학을 기록한다는 전통은 결국 중국 고대산문에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제시하며 그 형식의 발전에도 적지않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 산문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정치에 관련된 주장을 피력하거나 문물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데에도 활용되었으며, 정부의 갖가지 문서나 개인적인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두루 활용되었다. 한대(漢代)에는 특히 정치문제를 다룬 정론문(政論文)이 많이 지어졌으며, 당대(唐代) 이후에는 의론이나 서사 및 서정의 각 분야로 그 내용이 확대됐다.
그러나 주로 역사적 사실이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내용에 충실하여 씌어지던 이 산문의 영역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즉 남북조시대에 이르러 정치와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고 문학 자체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면서부터 문학의 형식미에 치중하려는 풍조가 크게 성행한다. 이 시기는 고대산문에 있어서는 정체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학 전반을 두고 평가하면 또 다른 큰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기도 하다.
공허한 내용의 형식미 위주의 문학이 성행하며 주춤했던 산문은 당송(唐宋) 시기에 이르러 또 다른 면모로 새롭게 발전되어 부흥한다. 즉 공허한 내용에 형식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풍조에 반대하여 실용성을 중시하여 충실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을 되찾자는, 이른바 고문운동(古文運動)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중심인물은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인데 이들은 주로 예전 성인들의 가르침을 내용으로 하는 진(秦) 이전의 알기 쉬운 소박한 글을 본받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 다양한 내용을 담은 새롭게 개발된 여러 가지 단편의 산문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 내용과 용도 및 형식에서 다양성을 더하며 새롭게 부흥되었다. 이때에는 이미 역사 기록이나 사상의 전파를 위한 글뿐만 아니라 의론하고 현실을 풍자하는가 하면 또 개인적인 사실이나 감정까지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시작된 고문운동, 즉 새로운 산문 개혁운동은 宋대의 고문가에게로 이어져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다시금 산문의 극성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앞의 한유와 유종원 외에 송대의 구양수(歐陽修)·왕안석(王安石)·증공(曾鞏)·소순(蘇洵)·소식(蘇軾)·소철(蘇轍) 등은 이른바 당송팔대가로서 산문의 부흥에 더없이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이다.
산문이 극성한 당송 이후 소설이나 희곡 등 여러 가지 문학양식이 새롭게 출현하여 발전하는가 하면 팔고문(八股文)과 같은 일정한 형식에 얽매인 시험용 산문이 유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산문은 명청(明淸)시기를 거치면서 이론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소품문(小品文)과 같은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면서 정통문학의 지위를 차지한 채 발전한다. 다만 명청시대에 이르러서는 주로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 실제 창작이라는 면에서는 이미 당송시대의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이전의 것을 본받는 수준에 머물러 산문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요약해 보면, 역사 사실이나 철학 또는 사상의 기록에서 시작된 산문은 후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내용상에서 다양해졌으며 단편의 산문으로 발전했다. 또한 학술 위주의 것에서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순수 문학의 영역으로 확대됨으로써 그 실용성이 증대됐다. 한편 산문은 형식미가 강조되던 시기에는 크게 유행하기 어려웠으며, 선진(先秦)시기와 한대(漢代) 및 당송시기에 가장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다.
≪서경≫은 역사가들이 쓴 요순(堯舜)시대로부터 주대(周代)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기록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는 점은 고대산문의 중요한 전통이다. 이러한 전통은 공자가 쓴 춘추시대의 역사서 ≪춘추(春秋)≫와 다시 이를 자세히 풀이한 ≪좌전(左傳)≫으로 이어졌다. 또 뒤이어 나온 ≪국어(國語)≫나 ≪전국책(戰國策)≫, 그리고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등등이 모두 역사 기록이라는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한 산문의 정화이다.
한편 공자의 사상을 담은 ≪논어(論語)≫와 장자의 철학을 담은 ≪장자(莊子)≫를 비롯하여 제자백가의 많은 서적들이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씌어졌으며 ≪역경(易經)≫ 같은 철학서도 출현한다. 이들은 모두 사상적·철학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후 산문 저작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통이 됐다.
위에서 본 역사나 사상·철학을 기록한다는 전통은 결국 중국 고대산문에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제시하며 그 형식의 발전에도 적지않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 산문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정치에 관련된 주장을 피력하거나 문물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데에도 활용되었으며, 정부의 갖가지 문서나 개인적인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두루 활용되었다. 한대(漢代)에는 특히 정치문제를 다룬 정론문(政論文)이 많이 지어졌으며, 당대(唐代) 이후에는 의론이나 서사 및 서정의 각 분야로 그 내용이 확대됐다.
그러나 주로 역사적 사실이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내용에 충실하여 씌어지던 이 산문의 영역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즉 남북조시대에 이르러 정치와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고 문학 자체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면서부터 문학의 형식미에 치중하려는 풍조가 크게 성행한다. 이 시기는 고대산문에 있어서는 정체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학 전반을 두고 평가하면 또 다른 큰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기도 하다.
공허한 내용의 형식미 위주의 문학이 성행하며 주춤했던 산문은 당송(唐宋) 시기에 이르러 또 다른 면모로 새롭게 발전되어 부흥한다. 즉 공허한 내용에 형식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풍조에 반대하여 실용성을 중시하여 충실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을 되찾자는, 이른바 고문운동(古文運動)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중심인물은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인데 이들은 주로 예전 성인들의 가르침을 내용으로 하는 진(秦) 이전의 알기 쉬운 소박한 글을 본받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 다양한 내용을 담은 새롭게 개발된 여러 가지 단편의 산문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 내용과 용도 및 형식에서 다양성을 더하며 새롭게 부흥되었다. 이때에는 이미 역사 기록이나 사상의 전파를 위한 글뿐만 아니라 의론하고 현실을 풍자하는가 하면 또 개인적인 사실이나 감정까지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시작된 고문운동, 즉 새로운 산문 개혁운동은 宋대의 고문가에게로 이어져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다시금 산문의 극성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앞의 한유와 유종원 외에 송대의 구양수(歐陽修)·왕안석(王安石)·증공(曾鞏)·소순(蘇洵)·소식(蘇軾)·소철(蘇轍) 등은 이른바 당송팔대가로서 산문의 부흥에 더없이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이다.
산문이 극성한 당송 이후 소설이나 희곡 등 여러 가지 문학양식이 새롭게 출현하여 발전하는가 하면 팔고문(八股文)과 같은 일정한 형식에 얽매인 시험용 산문이 유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산문은 명청(明淸)시기를 거치면서 이론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소품문(小品文)과 같은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면서 정통문학의 지위를 차지한 채 발전한다. 다만 명청시대에 이르러서는 주로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 실제 창작이라는 면에서는 이미 당송시대의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이전의 것을 본받는 수준에 머물러 산문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요약해 보면, 역사 사실이나 철학 또는 사상의 기록에서 시작된 산문은 후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내용상에서 다양해졌으며 단편의 산문으로 발전했다. 또한 학술 위주의 것에서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순수 문학의 영역으로 확대됨으로써 그 실용성이 증대됐다. 한편 산문은 형식미가 강조되던 시기에는 크게 유행하기 어려웠으며, 선진(先秦)시기와 한대(漢代) 및 당송시기에 가장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