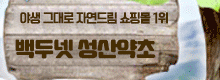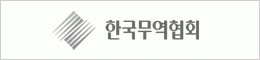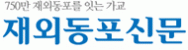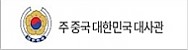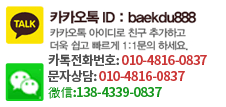토지공개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4 09:45|본문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寓居)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구약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원조로 불리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관심은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었다.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는 자본가들의 소득도 땀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당하며, 자본축적이 확대되어야 노동자들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노동자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것은 지대(地代)다.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먹는 불노소득(不勞所得)이기 때문에 우선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지대는 마치 몸속의 기생충처럼 경제가 성장할수록 덩달아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경제성장↑→인구/투자↑→토지수요↑→지대↑’의 구조를 갖는다. 문제는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토지는 공급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독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대 상승률은 경제성장의 속도, 즉 이윤과 임금의 상승률을 앞지른다는 점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뼈 빠지게 일해 봤자 지주들만 좋아진다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뉴욕처럼 발전한 도시의 가난뱅이들이 캘리포니아처럼 낙후된 지역의 가난뱅이들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소수의 지주들이 개발과 성장의 성과를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자본가들은 투자의욕을 잃고 노동자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대 상승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는 것은 이미 2백 년 전에 리카도(D. Ricardo)가 입증한 사실이다. 리카도의 분석에 따르면 지주의 이익은 언제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배치된다.
헨리 조지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방법은 토지국유제와 같은 사회주의적 방식이 아니고 지대에 대한 중과세였다. 그는 토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대 즉 불노소득에 해당하는 지대를 모조리 세금으로 거둬들이라고 요구했다. 지대는 경제성장이라는 사회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사회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거둬들일 수 있는 조세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아도 정부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유명한 ‘토지단일세론’이다.
헨리 조지가 빨갱이가 아닌 것은 세계최강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프리드먼(Friedman)이 토지단일세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걸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는 바람에 토지공개념이 마치 좌익적인 발상인 것처럼 왜곡되어 버렸다.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택지소유상한선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등 법률의 기술적인 하자였지, 토지공개념의 정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오늘날 우리나라의 토지소유문제 즉 부동산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아주 현저히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노소득을 방치하는 바람에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 모두가 땀 흘려 번 돈들이 죄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50년 동안 서울 땅값이 4만 배 이상 올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가(地價)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서둘러 외국으로 이전하고, 집 없는 서민들은 일할 의욕조차 상실하고 있다. 전국 토지의 82.7%를 상위 5%(조선일보의 대단한 반론에 의하면 상위 14%)가 소유하는 이 극단적인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적 불화와 반목을 잠재울 수 없다.
토지공개념 또는 지대공개념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이 걸린 문제다. 기업가와 노동자 모두를 물 먹이고 국가경제의 활력을 빼앗아 가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 땅과 집 가지고 장난치는 불노소득자들에 대한 도덕적 사회경제적으로 정당한 조치인 것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말할 것도 없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부동산 소유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아멘. 구약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원조로 불리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관심은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었다.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는 자본가들의 소득도 땀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당하며, 자본축적이 확대되어야 노동자들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노동자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것은 지대(地代)다.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먹는 불노소득(不勞所得)이기 때문에 우선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지대는 마치 몸속의 기생충처럼 경제가 성장할수록 덩달아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경제성장↑→인구/투자↑→토지수요↑→지대↑’의 구조를 갖는다. 문제는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토지는 공급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독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대 상승률은 경제성장의 속도, 즉 이윤과 임금의 상승률을 앞지른다는 점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뼈 빠지게 일해 봤자 지주들만 좋아진다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뉴욕처럼 발전한 도시의 가난뱅이들이 캘리포니아처럼 낙후된 지역의 가난뱅이들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소수의 지주들이 개발과 성장의 성과를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자본가들은 투자의욕을 잃고 노동자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대 상승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는 것은 이미 2백 년 전에 리카도(D. Ricardo)가 입증한 사실이다. 리카도의 분석에 따르면 지주의 이익은 언제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배치된다.
헨리 조지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방법은 토지국유제와 같은 사회주의적 방식이 아니고 지대에 대한 중과세였다. 그는 토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대 즉 불노소득에 해당하는 지대를 모조리 세금으로 거둬들이라고 요구했다. 지대는 경제성장이라는 사회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사회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거둬들일 수 있는 조세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아도 정부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유명한 ‘토지단일세론’이다.
헨리 조지가 빨갱이가 아닌 것은 세계최강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프리드먼(Friedman)이 토지단일세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걸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는 바람에 토지공개념이 마치 좌익적인 발상인 것처럼 왜곡되어 버렸다.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택지소유상한선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등 법률의 기술적인 하자였지, 토지공개념의 정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오늘날 우리나라의 토지소유문제 즉 부동산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아주 현저히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노소득을 방치하는 바람에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 모두가 땀 흘려 번 돈들이 죄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50년 동안 서울 땅값이 4만 배 이상 올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가(地價)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서둘러 외국으로 이전하고, 집 없는 서민들은 일할 의욕조차 상실하고 있다. 전국 토지의 82.7%를 상위 5%(조선일보의 대단한 반론에 의하면 상위 14%)가 소유하는 이 극단적인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적 불화와 반목을 잠재울 수 없다.
토지공개념 또는 지대공개념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이 걸린 문제다. 기업가와 노동자 모두를 물 먹이고 국가경제의 활력을 빼앗아 가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 땅과 집 가지고 장난치는 불노소득자들에 대한 도덕적 사회경제적으로 정당한 조치인 것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말할 것도 없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부동산 소유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