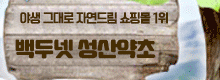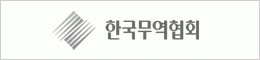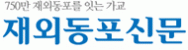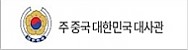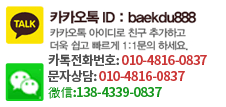미국은 어쩌다 중국을 잃어버렸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3-24 22:06|본문
미국은 어쩌다 중국을 잃어버렸나
2016-03-24 20:34


장제스의 참모장, 중국-버마-인도 전구의 미국 총사령관을 지낸 조지프 스틸웰 중장의 친구이자 정치적 조언자 존 페이턴 데이비스가 1944년 10월 옌안에서 중국 공산당 수뇌부와 함께 찍은 사진. 왼쪽부터 저우언라이, 팔로군 총사령 주더, 데이비스, 마오쩌둥, 팔로군 참모장 예젠잉. 펜실베이니아대 프레스, 책과함께 제공
일본 패전 뒤 국공내전 때
장제스 편들다 쫓겨난 미국
그리고 소련·국민당·공산당 전략
2차대전 말 미군의 일본 본토 침공작전 지휘자 더글러스 맥아더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소련군 60개 사단, 50만명 이상의 병력을 만주에 투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미국 군사전략가들은 미군이 일본 본토 침공에 나설 경우 10만에서 35만명의 미군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만주와 북중국 지역에 소련이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든다면 100만명의 일본군을 만주에 묶어둘 수 있을 것으로 본 미국 군부는 소련군을 만주로 진격하게 하라고 아우성쳤다.
루스벨트는 미군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찍부터 소련군의 만주 출병을 요구했다. 1943년 테헤란 회담 때 그랬고 1945년 2월 얄타 협약 때 그것을 구체화했으며, 그해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재확인했다.
하버드대 존 페어뱅크 교수 밑에서 중국사를 공부한 저널리스트 리처드 번스타인의 <1945 중국, 미국의 치명적 선택>(China 1945- Mao’s Revolution and America’s Fateful Choice, 2014)은 당시 그런 결정이 결국 중국 공산화로 귀결되고 그 때문에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일어났다고만 할 뿐 한반도에 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전쟁 전에 먼저 한반도가 분단당했고, 그것은 당시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들의 담합 내지 흥정의 산물이었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얄타에서 루스벨트가 스탈린한테서 확약받고자 한 것 중 하나는 소련이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과 협정을 맺는 것이었다. 일본 본토 최종 공격을 중국 영토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본 미국은 중국이라는 작전기지를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봤고, 루스벨트는 소련과 국민당 정부 협정 체결이 그런 목적에 도움이 되거나, 적어도 소련이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번스타인은 루스벨트가 당시 마오쩌둥·저우언라이 등을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로 보고 있었고, 중국 국내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스탈린 쪽의 얘기도 사실로 믿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만일 소련이 국민당 정부와 협정을 맺게 되면 중국공산당을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 최종 패배 뒤 중국 내 국-공 내전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루스벨트는 계산했다는 것이다. 루스벨트가 바란 전후의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세력이 경합하는 친미적 연합정부가 다스리는 나라였다. 미국 정부 내에는 일본 패전 뒤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는 건 국민당이 아니라 더 유능하고 깨끗해 보였던 공산당 쪽일 것으로 보고 공산당과 협력하는 것이 중국의 소비에트화를 막고 친미 정권을 만드는 길이라고 보는 세력이 있었고, 루스벨트는 일종의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소련은 루스벨트에게 1904~5년 러일전쟁 때 일본에 빼앗긴 이권 회복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 만주에서 물러날 때 그것을 국민당 정부가 아니라 공산세력에 몰래 넘겨주었다. 이는 결국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에 영토적 기반을 마련해준 꼴이 됐고 장제스의 패배로 이어졌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잃어”버렸고, 1972년 리처드 닉슨의 중국 방문 때까지 30년 가까이 냉전적 대결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빼앗겼다”고도 하는 미국인들의 이 중국 ‘상실’감의 충격은 커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왜, 무엇 때문에 중국을 잃어버렸나”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기 직전인 1949년 10월1일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정부를 변호하려고 발표한 ‘중국 백서’(1944~49년의 미-중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참조문헌)가 그것을 상징한다.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이 서문을 쓴 이 백서는 중국의 공산화와 관련해 미국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직 타락하고 인기 없는 장제스 국민당 정부 탓에 중국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장제스 정부 평판을 손상시키지 말고 원조를 좀더 많이 해주었더라면, 공산세력과의 싸움을 중단하라고 압박하지 않았다면, 친서방 노선을 더 선명히 내세우고 전략적 목표를 더 분명하게 했더라면, 국무부 내 반국민 친공산 세력(?)의 방해공작이 없었다면 중국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여러 가정과 주장들은 지금도 이어진다. G2 시대에 미-중 간 알력과 힘겨루기가 뉴스의 초점이 되면서 70여년 전의 중국 ‘상실’이라는, 용어부터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냄새를 풍기는 그 사건이 출발점으로 다시 거론된다.
<1945 중국…>은 미국과 소련,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등 중국 ‘상실’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 내지 주역들의 생각과 움직임을 당시 주고받은 전문 등의 문헌자료나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정치·외교 드라마로 새롭게 재구성한다.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한반도 현대사를 연결지어 읽게 된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장제스 편들다 쫓겨난 미국
그리고 소련·국민당·공산당 전략
2차대전 말 미군의 일본 본토 침공작전 지휘자 더글러스 맥아더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소련군 60개 사단, 50만명 이상의 병력을 만주에 투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미국 군사전략가들은 미군이 일본 본토 침공에 나설 경우 10만에서 35만명의 미군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만주와 북중국 지역에 소련이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든다면 100만명의 일본군을 만주에 묶어둘 수 있을 것으로 본 미국 군부는 소련군을 만주로 진격하게 하라고 아우성쳤다.
루스벨트는 미군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찍부터 소련군의 만주 출병을 요구했다. 1943년 테헤란 회담 때 그랬고 1945년 2월 얄타 협약 때 그것을 구체화했으며, 그해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재확인했다.
하버드대 존 페어뱅크 교수 밑에서 중국사를 공부한 저널리스트 리처드 번스타인의 <1945 중국, 미국의 치명적 선택>(China 1945- Mao’s Revolution and America’s Fateful Choice, 2014)은 당시 그런 결정이 결국 중국 공산화로 귀결되고 그 때문에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일어났다고만 할 뿐 한반도에 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전쟁 전에 먼저 한반도가 분단당했고, 그것은 당시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들의 담합 내지 흥정의 산물이었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얄타에서 루스벨트가 스탈린한테서 확약받고자 한 것 중 하나는 소련이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과 협정을 맺는 것이었다. 일본 본토 최종 공격을 중국 영토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본 미국은 중국이라는 작전기지를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봤고, 루스벨트는 소련과 국민당 정부 협정 체결이 그런 목적에 도움이 되거나, 적어도 소련이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번스타인은 루스벨트가 당시 마오쩌둥·저우언라이 등을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로 보고 있었고, 중국 국내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스탈린 쪽의 얘기도 사실로 믿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만일 소련이 국민당 정부와 협정을 맺게 되면 중국공산당을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 최종 패배 뒤 중국 내 국-공 내전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루스벨트는 계산했다는 것이다. 루스벨트가 바란 전후의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세력이 경합하는 친미적 연합정부가 다스리는 나라였다. 미국 정부 내에는 일본 패전 뒤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는 건 국민당이 아니라 더 유능하고 깨끗해 보였던 공산당 쪽일 것으로 보고 공산당과 협력하는 것이 중국의 소비에트화를 막고 친미 정권을 만드는 길이라고 보는 세력이 있었고, 루스벨트는 일종의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소련은 루스벨트에게 1904~5년 러일전쟁 때 일본에 빼앗긴 이권 회복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 만주에서 물러날 때 그것을 국민당 정부가 아니라 공산세력에 몰래 넘겨주었다. 이는 결국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에 영토적 기반을 마련해준 꼴이 됐고 장제스의 패배로 이어졌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잃어”버렸고, 1972년 리처드 닉슨의 중국 방문 때까지 30년 가까이 냉전적 대결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빼앗겼다”고도 하는 미국인들의 이 중국 ‘상실’감의 충격은 커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왜, 무엇 때문에 중국을 잃어버렸나”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기 직전인 1949년 10월1일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정부를 변호하려고 발표한 ‘중국 백서’(1944~49년의 미-중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참조문헌)가 그것을 상징한다.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이 서문을 쓴 이 백서는 중국의 공산화와 관련해 미국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직 타락하고 인기 없는 장제스 국민당 정부 탓에 중국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장제스 정부 평판을 손상시키지 말고 원조를 좀더 많이 해주었더라면, 공산세력과의 싸움을 중단하라고 압박하지 않았다면, 친서방 노선을 더 선명히 내세우고 전략적 목표를 더 분명하게 했더라면, 국무부 내 반국민 친공산 세력(?)의 방해공작이 없었다면 중국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여러 가정과 주장들은 지금도 이어진다. G2 시대에 미-중 간 알력과 힘겨루기가 뉴스의 초점이 되면서 70여년 전의 중국 ‘상실’이라는, 용어부터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냄새를 풍기는 그 사건이 출발점으로 다시 거론된다.
<1945 중국…>은 미국과 소련,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등 중국 ‘상실’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 내지 주역들의 생각과 움직임을 당시 주고받은 전문 등의 문헌자료나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정치·외교 드라마로 새롭게 재구성한다.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한반도 현대사를 연결지어 읽게 된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