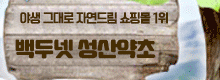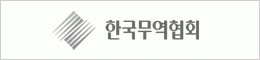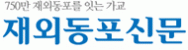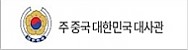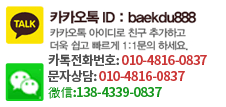한국 경제의 활로는 여전히 중국에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3-07 15:57|본문
중국 경제성장률 7%가 깨지자 중국 경제 경착륙이 이슈가 됐다. 상하이 증시가 폭락하자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에 회의를 품고 세계 증시가 일제히 추락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사방에서 들려온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고 2014년에는 전체 무역흑자의 1.7배를 중국에서 달성했다. 이제 이런 특수가 오지 않자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여건은 항상 변하게 마련이다. 특히 중국은 지금 변화의 와중에 있다. 이제 우리는 중국 경제의 새 패러다임에 주목해야 한다. 2003년에서 2012년 후진타오 정부는 ‘대국 시대’를 표방하면서 양을 중시했다. 자본과 노동의 대량 투입에 의한 성장이 목표였다. 수출과 투자 주도의 고속성장 시대였다. 이 기간 동안 국민총생산은 3.2배, 투자는 7배, 무역은 3.9배 늘었다.
경제라는 수레에서 제조업과 금융은 두 바퀴다. 이들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제조업이 너무 발전하면 생산설비 과잉을 가져오고 금융이 너무 발전하면 머니게임 양상이 벌어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후진타오 정부는 제조업에서만 고속성장을 했기 때문에 생산시설의 공급과잉이라는 숙제를 시진핑 정부에 남겼다.
2013년부터 2022년 시진핑 정부는 대국보다 ‘강국 시대’를 주창하면서 양보다 질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제도와 기술에 의존한 성장을 강조하면서 소비와 혁신 주도의 중속성장을 추구한다. 이제 더 이상 경제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성장률 목표 또한 축소해 7%대에서 6%대로 낮췄다. 장기적으로는 5%대 성장을 예상한다.
현재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의 2002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때 미국 성장률은 3%대였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률이 5~7%로 저하됐다고 중국의 경착륙과 위기를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국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우리는 너무 걱정을 하고 있다. 과거 향수에 심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중간재 수출로 재미를 보던 한국의 제조업은 이제 중국 특수를 잊어야 한다.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은 우리에게 가까이하기도, 그렇다고 멀리할 수도 없는 국가다. 현재 미국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가까운 나라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국가다. 한때 한자를 공유하기도 했고 중국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중국 고전에도 친숙하다. 삼국지 한두 번 안 읽어본 한국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유리한 면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중국의 변화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다.
중국은 실용적인 국가라고 한다. 중국인은 만만디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능가할 정도로 ‘콰이콰이’ 전략을 취한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에 맞춰 우리의 대응 방향을 신축적으로 정할 때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보자. 중국은 지금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을 중시한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중간재보다 소비재,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중국이라는 국가를 잘 활용하는 데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는 이를 인도 경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사방에서 들려온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고 2014년에는 전체 무역흑자의 1.7배를 중국에서 달성했다. 이제 이런 특수가 오지 않자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여건은 항상 변하게 마련이다. 특히 중국은 지금 변화의 와중에 있다. 이제 우리는 중국 경제의 새 패러다임에 주목해야 한다. 2003년에서 2012년 후진타오 정부는 ‘대국 시대’를 표방하면서 양을 중시했다. 자본과 노동의 대량 투입에 의한 성장이 목표였다. 수출과 투자 주도의 고속성장 시대였다. 이 기간 동안 국민총생산은 3.2배, 투자는 7배, 무역은 3.9배 늘었다.
경제라는 수레에서 제조업과 금융은 두 바퀴다. 이들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제조업이 너무 발전하면 생산설비 과잉을 가져오고 금융이 너무 발전하면 머니게임 양상이 벌어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후진타오 정부는 제조업에서만 고속성장을 했기 때문에 생산시설의 공급과잉이라는 숙제를 시진핑 정부에 남겼다.
2013년부터 2022년 시진핑 정부는 대국보다 ‘강국 시대’를 주창하면서 양보다 질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제도와 기술에 의존한 성장을 강조하면서 소비와 혁신 주도의 중속성장을 추구한다. 이제 더 이상 경제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성장률 목표 또한 축소해 7%대에서 6%대로 낮췄다. 장기적으로는 5%대 성장을 예상한다.
현재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의 2002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때 미국 성장률은 3%대였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률이 5~7%로 저하됐다고 중국의 경착륙과 위기를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국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우리는 너무 걱정을 하고 있다. 과거 향수에 심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중간재 수출로 재미를 보던 한국의 제조업은 이제 중국 특수를 잊어야 한다.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은 우리에게 가까이하기도, 그렇다고 멀리할 수도 없는 국가다. 현재 미국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가까운 나라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국가다. 한때 한자를 공유하기도 했고 중국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중국 고전에도 친숙하다. 삼국지 한두 번 안 읽어본 한국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유리한 면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중국의 변화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다.
중국은 실용적인 국가라고 한다. 중국인은 만만디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능가할 정도로 ‘콰이콰이’ 전략을 취한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에 맞춰 우리의 대응 방향을 신축적으로 정할 때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보자. 중국은 지금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을 중시한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중간재보다 소비재,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중국이라는 국가를 잘 활용하는 데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는 이를 인도 경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