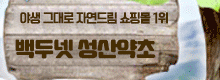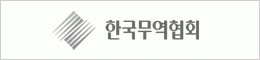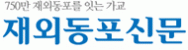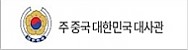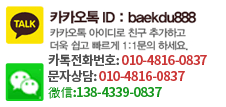중국 리스크와 저성장…한국의 대비책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2-22 13:23|본문
<곽찬호 경제평론가>
중국이 경제력의 급성장이 이룩되면서 세계경제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높아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연휴(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휴(RCEF)의 두 축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존해 교역에 있어서 주도권 쟁탈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人民元을 특별 인출권(SDR)의 구성통화에 추가하는 것을 정식으로 결정한데서 人民元은 일본의 인(円)을 뛰어넘어 미국의 달러와 EU(구주연합)의 유로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주요통화로 부상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국제무역과 금융시장에 있어서 달러와 人民元의 기축통화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부상해 기존의 아시아개발의 주도권을 쥔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WB)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긴장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미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데 있어서 미국의 FRB는 기준금리를 인상해 금융긴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는 달리 구주와 일본 등은 양적완화정책을 지속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 원재료가격의 하락 등 외국환의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의 통화위기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2017년 이 후 미국의 경기가 둔화할 경우 세계경기가 장기적으로 저속(低速)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외 쇼크에 대한 철저한 대응에 나서 수출경쟁력의 향상과 경제체질 개선을 향한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신흥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부진, 원자재가격의 하락이라는 세계경제의 3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외국인자본의 유출과 그에 수반된 통화위기발생의 염려와 중국의 경기감속으로 인한 수출경기 부진,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수출국(특히 산유국)의 재정악화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신흥국은 현재 문자 그대로 신흥국이 아니고 세계경제 성장의 밑바닥으로 전략할 상황에 있다.
한국 국내에 눈을 돌리면 한국의 잠정성장률이 3%를 밑도는 부정적인 전망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잠정성장률의 저하의 근본 원인은 소자?고령화, 투자부진, 낮은 R&D(연구개발)의 효율 등이다. 생산 면에서는 성장가능성의 기반이 되는 국내 주력산업이 서서히 실족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장기 성장률의 하락을 서비스산업이 보완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앞으로 잠재성장률 2%대로의 진입에 대비해 초점을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치중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통화완화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본은 가격경쟁력에서 한국과의 갭을 메우고 중국도 기술경쟁력에서 한국을 추격하는 등 샌드위치 상태에 와있다. 엔안(円安)으로 일본의 수출가격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한국이 일본제품에 대해 갖는 가격우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1.4년으로까지 축소하는 등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시장에 급속히 침투하고 있다.
생활면은 주택의 공급과잉의 염려가 확대와 전세수급의 불일치 등 요인으로 전세물건의 부족이 심각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금리가 지속돼 임차인이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통상의 가임수입으로 선회하는 한편 전세가격의 상승경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산업경기의 특징은 경기회복의 지연에 있다. 건축시장공급 과잉, 리딩 산업의 부재, 아시아 리스크의 대두,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인 역할의 기대가 되는 산업경기의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수경기의 활성화, FTA(자유무역협정)의 이용률 향상, 건설업 경기의 급격한 냉각 방지, 산업의 고부가가치의 노력과 신 성장 동력의 발굴, 대외 리스크관리의 강화, 재정집행 효과의 극대화 등이 필요하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人民元을 특별 인출권(SDR)의 구성통화에 추가하는 것을 정식으로 결정한데서 人民元은 일본의 인(円)을 뛰어넘어 미국의 달러와 EU(구주연합)의 유로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주요통화로 부상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국제무역과 금융시장에 있어서 달러와 人民元의 기축통화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부상해 기존의 아시아개발의 주도권을 쥔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WB)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긴장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미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데 있어서 미국의 FRB는 기준금리를 인상해 금융긴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는 달리 구주와 일본 등은 양적완화정책을 지속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 원재료가격의 하락 등 외국환의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의 통화위기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2017년 이 후 미국의 경기가 둔화할 경우 세계경기가 장기적으로 저속(低速)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외 쇼크에 대한 철저한 대응에 나서 수출경쟁력의 향상과 경제체질 개선을 향한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신흥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부진, 원자재가격의 하락이라는 세계경제의 3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외국인자본의 유출과 그에 수반된 통화위기발생의 염려와 중국의 경기감속으로 인한 수출경기 부진,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수출국(특히 산유국)의 재정악화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신흥국은 현재 문자 그대로 신흥국이 아니고 세계경제 성장의 밑바닥으로 전략할 상황에 있다.
한국 국내에 눈을 돌리면 한국의 잠정성장률이 3%를 밑도는 부정적인 전망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잠정성장률의 저하의 근본 원인은 소자?고령화, 투자부진, 낮은 R&D(연구개발)의 효율 등이다. 생산 면에서는 성장가능성의 기반이 되는 국내 주력산업이 서서히 실족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장기 성장률의 하락을 서비스산업이 보완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앞으로 잠재성장률 2%대로의 진입에 대비해 초점을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치중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통화완화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본은 가격경쟁력에서 한국과의 갭을 메우고 중국도 기술경쟁력에서 한국을 추격하는 등 샌드위치 상태에 와있다. 엔안(円安)으로 일본의 수출가격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한국이 일본제품에 대해 갖는 가격우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1.4년으로까지 축소하는 등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시장에 급속히 침투하고 있다.
생활면은 주택의 공급과잉의 염려가 확대와 전세수급의 불일치 등 요인으로 전세물건의 부족이 심각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금리가 지속돼 임차인이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통상의 가임수입으로 선회하는 한편 전세가격의 상승경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산업경기의 특징은 경기회복의 지연에 있다. 건축시장공급 과잉, 리딩 산업의 부재, 아시아 리스크의 대두,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인 역할의 기대가 되는 산업경기의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수경기의 활성화, FTA(자유무역협정)의 이용률 향상, 건설업 경기의 급격한 냉각 방지, 산업의 고부가가치의 노력과 신 성장 동력의 발굴, 대외 리스크관리의 강화, 재정집행 효과의 극대화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