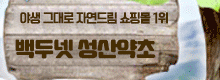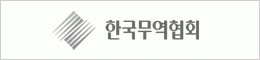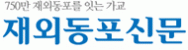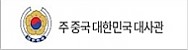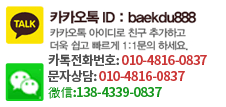학부모회와 家長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3 11:51|본문
아이 학교 학부모회에 들렀다. 이곳에서는 ‘자장후이(家長會)'라고 한다. 한국과 다른 점은 불가피한 경우 외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모두 다 참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 절반 가량은 아버지들이다. 부모가 오지 않는 아이는 여러모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학부모회에 대부분 참석하는 것 못지 않게 하교 때면 상당수 학부모들이 아이를 맞으려고 무리를 이루어 교문 앞을 서성대는 모습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라 해서 별반 다르지도 않다. 인원수에서만 차이가 있을뿐 전반적인 분위기는 엇비슷하다. 초등학교 입학 후 한 달만 지나면 아이 자립심에 저해된다며 마중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왜들 이러냐고 물어보았다. 단번에 되돌아오는 답변은 교통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모두들 아이 하나만 두고 있으니 일견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곳 풍경이다.
대부분 학교 학부모회는 교장 또는 부교장의 방송을 통한 인사말에서 시작, ‘반주런(班主任)'으로 불리는 담임교사의 일장훈시(혹은 당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별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들과의 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또 담임의 훈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전반부는 주로 반 내, 학년 내, 타 학교와의 상대평가를 포함한 학업성적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후반부는 생활지도 관련으로, 신세대들의 산만한 수업태도 등 마뜩찮은 점들을 열거하며 철저한 가정교육을 당부하곤 한다.
처음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당시 내가 놀란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그토록 많은 학부모들이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점이었다. 이를테면 이네들은 아이 교육에 대해 이토록 열성적이구나! 하는 일종의 감탄이었는데, 훗날 그것이 가능한 사회적 풍토를 알게 되었다.
예컨대 한국의 직장에서는 부모가 아이 학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조퇴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버젓한 명분이 되고 있으며, 또 응당 그래야 하는 일로 여겨지는 풍토인 것이다.
또 하나는 학업성적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다. 어쩜 우리네 60 - 70년대와 거의 꼭같은 풍경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지금도 신기하기 짝이 없다. 물론 우리네라 해서 아이 학업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부모야 없겠지만 학교교육을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소양을 쌓는 과정으로 치부하고 특기교육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우리네 학부모들과는 분명 접근방법이 다르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이곳 아이들 가슴을 생각해 보았다. 몇 백 명에 불과한 한 학년에서 이토록 삭막한 경쟁 분위기에 시달려야 한다면 수 백만 인구의 도시, 수 천만 인구의 성(省)이라면 오죽할까. 그리고 전 중국이라면… 나도 모르게 나까지 가슴이 답답해졌다.
학부모회에 대부분 참석하는 것 못지 않게 하교 때면 상당수 학부모들이 아이를 맞으려고 무리를 이루어 교문 앞을 서성대는 모습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라 해서 별반 다르지도 않다. 인원수에서만 차이가 있을뿐 전반적인 분위기는 엇비슷하다. 초등학교 입학 후 한 달만 지나면 아이 자립심에 저해된다며 마중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왜들 이러냐고 물어보았다. 단번에 되돌아오는 답변은 교통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모두들 아이 하나만 두고 있으니 일견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곳 풍경이다.
대부분 학교 학부모회는 교장 또는 부교장의 방송을 통한 인사말에서 시작, ‘반주런(班主任)'으로 불리는 담임교사의 일장훈시(혹은 당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별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들과의 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또 담임의 훈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전반부는 주로 반 내, 학년 내, 타 학교와의 상대평가를 포함한 학업성적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후반부는 생활지도 관련으로, 신세대들의 산만한 수업태도 등 마뜩찮은 점들을 열거하며 철저한 가정교육을 당부하곤 한다.
처음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당시 내가 놀란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그토록 많은 학부모들이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점이었다. 이를테면 이네들은 아이 교육에 대해 이토록 열성적이구나! 하는 일종의 감탄이었는데, 훗날 그것이 가능한 사회적 풍토를 알게 되었다.
예컨대 한국의 직장에서는 부모가 아이 학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조퇴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버젓한 명분이 되고 있으며, 또 응당 그래야 하는 일로 여겨지는 풍토인 것이다.
또 하나는 학업성적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다. 어쩜 우리네 60 - 70년대와 거의 꼭같은 풍경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지금도 신기하기 짝이 없다. 물론 우리네라 해서 아이 학업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부모야 없겠지만 학교교육을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소양을 쌓는 과정으로 치부하고 특기교육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우리네 학부모들과는 분명 접근방법이 다르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이곳 아이들 가슴을 생각해 보았다. 몇 백 명에 불과한 한 학년에서 이토록 삭막한 경쟁 분위기에 시달려야 한다면 수 백만 인구의 도시, 수 천만 인구의 성(省)이라면 오죽할까. 그리고 전 중국이라면… 나도 모르게 나까지 가슴이 답답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