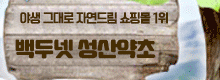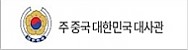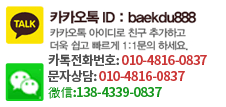중국어 한글표기법, "따지지 말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7 10:32|본문
이곳 선양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다. 당시만 해도 중국과의 수교 기간이 짧은 탓이었던지 중국어 표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기자들이 꽤나 있어서 일간지에서조차 ‘선양’과 ‘센양’이 혼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중국어 발음에 가까우냐고 대외한어(對外漢語)를 담당하는 교수 양반에게 물어 보았다. 중국어 병음(拼音)으로 표기할 때의 ‘sh' 발음이 한국어에는 없는 탓에 감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 다 아니라는 답변이었다. 내 귀엔 아직도 오히려 ’션양‘이 더욱 정확한 발음에 가깝게 들린다. 그리고 이곳 선양 현지인들 특히 조선족 동포들은 ’세양‘ 혹은 강조하고자 된 발음을 할 경우 ’쎄이양‘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중국어 표기법에 대한 시비를 심심치 않게 본다. 물론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화젯거리가 되는 건 아니다. 중국에서 살다 보니, 또 내가 언어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그런 종류의 화제나 기고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뿐이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와는 담쌓고 지내는 사람에게야 이게 무슨 서푼어치 가치라도 있겠는가? 하지만 적어도 선양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한국사람에게는 비록 간접적일망정 이 문제는 꽤 피부에 와 닿는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 표기법에 대해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조(聲調) 등 중국어의 특성상 정확한 우리말 표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왜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한국어 독음(讀音)을 젖혀 두고 교육 당국과 언론 매체에서 굳이 어거지처럼 꿰어 맞춘 듯한 표기법을 고집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명과 지명이다. 즉 ‘大連’의 경우 정확히 '따롄'이 아닐 바에는 구태여 '다롄'이라 표기하지 말고 혼동을 피해 차라리 '대련'이라고 쓰자는 것이다.
우선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의 중국어 관련 내용을 살펴 보자.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재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와 ‘중국의 역사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의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그리고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서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과거인인 중국 북송시대 시인 ‘蘇東坡’는 ‘쑤둥퍼’가 아니라 ‘소동파’이고, 현재인인 중국 총리 ‘溫家寶’는 ‘온가보’가 아니라 ‘원자바오’이다. (원래는 ‘원쟈바오’가 되어야 하나, ‘ㅈ, ㅉ, ㅊ’ 자음 뒤의 ‘ㅑ, ㅖ, ㅛ, ㅠ’ 음은 ‘ㅏ, ㅔ, ㅗ, ㅜ’로 적는다는 원칙에 의해 ‘원자바오’로 쓴다) 과거인과 현재인의 구분은 신중국 성립을 기준으로 삼기에 ‘毛澤東’부터는 ‘모택동’이 아니라 ‘마오쩌둥’이다. 그리고 역사지명인 ‘少林寺’는 ‘샤오린쓰’가 아니라 ‘소림사’이고, 역사지명이긴 하지만 현재의 지명과 동일한 ‘北京’, ‘西安’, ‘開封’ 등은 ‘북경’, ‘서안’, ‘개봉’이 아니라 ‘베이징’, ‘시안’, ‘카이펑’이다. 관용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고 한자를 병기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은 ‘베이징’, ‘시안’, ‘카이펑’이라는 이야기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난 중국어 표기법이 현지 발음과 맞네 안 맞네 하는 진부한 논란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한다. 왜냐 하면 표기법은 문자 그대로 사회적 약속이므로 그걸 지키면 그만인 것이다. 또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법규가 아닌 이상 그걸 지키고 싶은 사람이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지키기를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만약 "~했습니다"의 자모 순서로 얘기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니습다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경원당하고 종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나 개인의 소견은 전문가들이 고생스런 연구 끝에 이왕 만든 것이니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다.
원래 언어간에는 이쪽에 있는 발음이 저쪽에 없고, 저쪽에 있는 발음이 이쪽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어떤 언어든 반드시 자모와 발음부터 공부하는 것 아니던가. 영어 단어 ‘beautiful'의 발음이 한국어 표기법으로는 ’뷰티플‘이지만 발음까지 그러하던가? 내 귀엔 아직도 ’뷰러프~‘로 들린다. ’self'의 발음도 '셀프'가 아니라 실은 '세우프'이다. 독일어의 ’우믈라우트' 자모 3개 중 ‘O Umlaut'와 ’U Umlaut'도 우리말에 그런 발음은 없지만 표기할 때는 ‘ㅚ’, ‘ㅟ’로 하기로 정했다. 프랑스어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Versailles'와 ’Marseilles'가 발음상으로는 ‘벡사이’, ‘막세이’에 가깝지만, 표기할 때는 ‘베르사이유’, ‘마르세이유’이다. 일본어 자모 ‘つ’, 러시아어 자모 ‘Щ’, ‘ж’, ‘Ы’ 등도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이지만 가장 근접한 한글 자모를 찾아서 표기할 수는 있다. 중국어의 경우는 이들 소리글자와는 체제가 전혀 다른 뜻글자이기에 우리말로 표기하기에 더욱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익은 한자어로 중첩되는 단어가 많아서 쉽사리 시비의 대상이 되는 모양이다.
중국어의 인명과 지명 중 외래어 부분을 살펴 보자. 라틴계 단어를 도입해 중국어 외래어로 만든 경우 소리를 딴 게 있는가 하면 뜻글자 체제상 원래의 뜻을 살려 만든 것도 많다. 즉 ‘뉴위에’로 발음되는 '紐約'은 'New York‘의 음을 딴 것이지만 ’聖○○'는 'Saint ○○‘의 뜻을 살린 것이다. 소리를 따온 것 중 원래의 발음과는 사뭇 다른 것이 많다. ‘洛衫磯(혹은 羅城)’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溫哥華’는 캐나다의 ‘밴쿠버’인데, ‘뤄산지(혹은 뤄청)’, ‘원거화’라는 이 발음을 듣고 해당 지명을 연상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이를 한국어 독음 그대로 읽자는 주장에 따라 ‘낙삼기’, ‘온가화’라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넌센스이다. ‘라무스페이얼더(拉姆斯菲尔德)'를 듣고 그게 ‘럼스펠드(Rumsfeld)’인지 깨닫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안 그래도 알아 듣기 어려운데, 그럼 이걸 또 ‘납모사비이덕’이라 해야 한단 말인가?
근대 이래 서양에서 문물과 함께 소리글자 체제의 단어들도 마구 밀려들었다. 호환성이 뛰어난 한글을 가진 우리와는 달리 뜻글자 언어체계를 가진 중국인들은 매우 곤혹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Celcius'와 ’Farenheit'의 경우 이를 ‘攝氏’와 ‘華氏’로 줄여버렸다. 'Ce 씨'가, 그리고 'Fa 씨'가 만든 것이라는 뜻이다. 우린 수고를 덜고 이걸 그대로 차용해서 ‘섭씨’와 ‘화씨’로 쓰고 있다. 비단 인명과 지명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영어의 ‘hot line', 'honey moon', 'make love'는 한 단어씩 뜻을 새겨 ’熱線‘, ’密月‘, ’做愛‘로 만들었다. 이 중 '밀월'은 우리도 쓰고 있다. 내가 심심풀이로 찾은 이런 중국어의 영어 외래어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한자문화권이 아닌 나라의 단어를 뜻글자인 중국어로 풀어 내기에 중국인들은 이처럼 애를 먹고 있다. 소리글자와의 호환성이 없는 탓이다.
중국어 표기법이 중국어 발음에 근접하지 않다고 해서, 또 이미 만들어 둔 한국어 독음이 쓰기가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평을 하는 건 국제화시대에 재고되어야 할 일이다. 외국어, 그 중 특히 까다로운 중국어 발음을 이나마 표기해 내는 건 한마디로 한글이 우수한 문자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언어 자모가 이만큼이나마 중국어 발음을 문자로 재현해 내고 있는가? 중국어의 병음이란 것도 워낙 소리글자의 문자로 풀어 내기가 어려웠기에 청나라 말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로마자를 끌어들여 얼추 비교적 정교하게 만든 것이다.
중국어 표기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것만을 문제로 삼는다. 범위를 두 언어 사이에만 국한하면 그건 분명 타당성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잘 가꾸고 다듬어 온 한국어 독음을 그대로 살려 가자는데 원칙적으로 누가 반대할까? 특히 조선족들의 경우 감성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다. 이국 땅에서 100년을 어렵사리 ‘연변’과 ‘용정’을 지켜 왔는데, 큰집 격인 한국이 마치 변심해 버린 본댁처럼 난데없이 ‘옌볜’이니 ‘룽징’이니 하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곧 세계라고 생각했던 중세 조선과 지금은 시대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구촌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일 뿐이다. 조선족 역시 이러한 관점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인명과 지명을 그렇게 표기하기로 한 것은 혼란을 막고 잘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어에만 꿰어 맞추려 하다 보면 중국어 아닌 외국어 표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明月山’을 중국인들은 ‘밍위에산’, 한국인들은 ‘명월산’, 일본인들은 ‘아끼게츠야마’ 또는 ‘메게츠짠’이라고 읽는다.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이 예에서 보듯 표기와 발음은 다르다. 단지 일정 사회 구성원끼리 그렇게 읽고 그렇게 쓰기로 한 사회적 약속을 따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카페’라고 쓰되 ‘까페’라 발음하고, ‘스페인’이라 쓰되 ‘스뻬인’이라 발음하면 되는 것과도 같다. ‘브릿지스톤(bridgestone)'이라 쓰고 모두가 ’브릳지스톤‘으로 읽고 있지 않은가? 실제 발음은 ’브릳지스토운‘이지만 말이다.
혹자는 중국인들이 저들 식으로 발음하는데 우리라 해서 마냥 그들 식을 따르기만 할 게 아니라 한국어 독음대로 쓰자고도 주장한다. 예컨대 내 이름은 ‘박정태’이다. 이런 나를 중국인들은 중국어 발음으로 ‘피아오딩타이’라고 부른다. 듣는 내가 그다지 유쾌할 리는 없다. 다만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양해하는 것뿐이다. ‘압둘 무스타파 아브라힘’이란 긴 이름을 가진 아랍인이 소통의 편의상 스스로 ‘알리’라고 소개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수월한 편 아닌가? 그러나 어눌한 발음이지만 공을 들여가며 날 ‘박정태 씨’라고 불러 주는 중국인도 있다.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겠는가? 길거리 중국인들이 ‘바담 풍’하든 말든 우린 ‘바람 풍’하면 되는 것이지 국제화시대에 저들과 이만한 일로 아웅다웅할 계제가 아니다.
1988년을 기점으로 우리말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대세를 따랐다. ‘상치’가 ‘상추’로 바뀌는 등 실제로 범용되고 있는 것을 많이 인정했다. 청나라 시대의 중국인과 신중국 이후의 중국인들이 쓰는 말이 같지 않듯 조선시대의 사람과 대한민국의 사람이 쓰는 말이 같지 않다. 이처럼 언어 자체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지 정해진 법률이 아니다. 그러나 표기법이란 건 적어도 바뀌기 전까지는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추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이니까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나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사람들은 읽고 쓰는데 ‘심양’과 ‘선양’을 제각기 편한대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된다. 단 공식적인 문건이나 외국인들도 함께 한 공개적인 장소에서만큼은 지켜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양'이라 표기하되 한국인끼리 얘기할 때는 '심양', 중국인과 대화할 때는 'shenyang'으로 발음해 주는 것이다. 마치 중국인들이 자기네끼리는 ‘원거화’라 얘기할지라도 외국인인 내게는 ‘밴쿠버’로 발음해 주는 것처럼…….
한국어의 중국어 표기법에 대한 시비를 심심치 않게 본다. 물론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화젯거리가 되는 건 아니다. 중국에서 살다 보니, 또 내가 언어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그런 종류의 화제나 기고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뿐이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와는 담쌓고 지내는 사람에게야 이게 무슨 서푼어치 가치라도 있겠는가? 하지만 적어도 선양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한국사람에게는 비록 간접적일망정 이 문제는 꽤 피부에 와 닿는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 표기법에 대해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조(聲調) 등 중국어의 특성상 정확한 우리말 표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왜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한국어 독음(讀音)을 젖혀 두고 교육 당국과 언론 매체에서 굳이 어거지처럼 꿰어 맞춘 듯한 표기법을 고집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명과 지명이다. 즉 ‘大連’의 경우 정확히 '따롄'이 아닐 바에는 구태여 '다롄'이라 표기하지 말고 혼동을 피해 차라리 '대련'이라고 쓰자는 것이다.
우선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의 중국어 관련 내용을 살펴 보자.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재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와 ‘중국의 역사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의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그리고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서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과거인인 중국 북송시대 시인 ‘蘇東坡’는 ‘쑤둥퍼’가 아니라 ‘소동파’이고, 현재인인 중국 총리 ‘溫家寶’는 ‘온가보’가 아니라 ‘원자바오’이다. (원래는 ‘원쟈바오’가 되어야 하나, ‘ㅈ, ㅉ, ㅊ’ 자음 뒤의 ‘ㅑ, ㅖ, ㅛ, ㅠ’ 음은 ‘ㅏ, ㅔ, ㅗ, ㅜ’로 적는다는 원칙에 의해 ‘원자바오’로 쓴다) 과거인과 현재인의 구분은 신중국 성립을 기준으로 삼기에 ‘毛澤東’부터는 ‘모택동’이 아니라 ‘마오쩌둥’이다. 그리고 역사지명인 ‘少林寺’는 ‘샤오린쓰’가 아니라 ‘소림사’이고, 역사지명이긴 하지만 현재의 지명과 동일한 ‘北京’, ‘西安’, ‘開封’ 등은 ‘북경’, ‘서안’, ‘개봉’이 아니라 ‘베이징’, ‘시안’, ‘카이펑’이다. 관용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고 한자를 병기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은 ‘베이징’, ‘시안’, ‘카이펑’이라는 이야기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난 중국어 표기법이 현지 발음과 맞네 안 맞네 하는 진부한 논란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한다. 왜냐 하면 표기법은 문자 그대로 사회적 약속이므로 그걸 지키면 그만인 것이다. 또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법규가 아닌 이상 그걸 지키고 싶은 사람이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지키기를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만약 "~했습니다"의 자모 순서로 얘기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니습다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경원당하고 종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나 개인의 소견은 전문가들이 고생스런 연구 끝에 이왕 만든 것이니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다.
원래 언어간에는 이쪽에 있는 발음이 저쪽에 없고, 저쪽에 있는 발음이 이쪽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어떤 언어든 반드시 자모와 발음부터 공부하는 것 아니던가. 영어 단어 ‘beautiful'의 발음이 한국어 표기법으로는 ’뷰티플‘이지만 발음까지 그러하던가? 내 귀엔 아직도 ’뷰러프~‘로 들린다. ’self'의 발음도 '셀프'가 아니라 실은 '세우프'이다. 독일어의 ’우믈라우트' 자모 3개 중 ‘O Umlaut'와 ’U Umlaut'도 우리말에 그런 발음은 없지만 표기할 때는 ‘ㅚ’, ‘ㅟ’로 하기로 정했다. 프랑스어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Versailles'와 ’Marseilles'가 발음상으로는 ‘벡사이’, ‘막세이’에 가깝지만, 표기할 때는 ‘베르사이유’, ‘마르세이유’이다. 일본어 자모 ‘つ’, 러시아어 자모 ‘Щ’, ‘ж’, ‘Ы’ 등도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이지만 가장 근접한 한글 자모를 찾아서 표기할 수는 있다. 중국어의 경우는 이들 소리글자와는 체제가 전혀 다른 뜻글자이기에 우리말로 표기하기에 더욱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익은 한자어로 중첩되는 단어가 많아서 쉽사리 시비의 대상이 되는 모양이다.
중국어의 인명과 지명 중 외래어 부분을 살펴 보자. 라틴계 단어를 도입해 중국어 외래어로 만든 경우 소리를 딴 게 있는가 하면 뜻글자 체제상 원래의 뜻을 살려 만든 것도 많다. 즉 ‘뉴위에’로 발음되는 '紐約'은 'New York‘의 음을 딴 것이지만 ’聖○○'는 'Saint ○○‘의 뜻을 살린 것이다. 소리를 따온 것 중 원래의 발음과는 사뭇 다른 것이 많다. ‘洛衫磯(혹은 羅城)’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溫哥華’는 캐나다의 ‘밴쿠버’인데, ‘뤄산지(혹은 뤄청)’, ‘원거화’라는 이 발음을 듣고 해당 지명을 연상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이를 한국어 독음 그대로 읽자는 주장에 따라 ‘낙삼기’, ‘온가화’라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넌센스이다. ‘라무스페이얼더(拉姆斯菲尔德)'를 듣고 그게 ‘럼스펠드(Rumsfeld)’인지 깨닫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안 그래도 알아 듣기 어려운데, 그럼 이걸 또 ‘납모사비이덕’이라 해야 한단 말인가?
근대 이래 서양에서 문물과 함께 소리글자 체제의 단어들도 마구 밀려들었다. 호환성이 뛰어난 한글을 가진 우리와는 달리 뜻글자 언어체계를 가진 중국인들은 매우 곤혹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Celcius'와 ’Farenheit'의 경우 이를 ‘攝氏’와 ‘華氏’로 줄여버렸다. 'Ce 씨'가, 그리고 'Fa 씨'가 만든 것이라는 뜻이다. 우린 수고를 덜고 이걸 그대로 차용해서 ‘섭씨’와 ‘화씨’로 쓰고 있다. 비단 인명과 지명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영어의 ‘hot line', 'honey moon', 'make love'는 한 단어씩 뜻을 새겨 ’熱線‘, ’密月‘, ’做愛‘로 만들었다. 이 중 '밀월'은 우리도 쓰고 있다. 내가 심심풀이로 찾은 이런 중국어의 영어 외래어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한자문화권이 아닌 나라의 단어를 뜻글자인 중국어로 풀어 내기에 중국인들은 이처럼 애를 먹고 있다. 소리글자와의 호환성이 없는 탓이다.
중국어 표기법이 중국어 발음에 근접하지 않다고 해서, 또 이미 만들어 둔 한국어 독음이 쓰기가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평을 하는 건 국제화시대에 재고되어야 할 일이다. 외국어, 그 중 특히 까다로운 중국어 발음을 이나마 표기해 내는 건 한마디로 한글이 우수한 문자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언어 자모가 이만큼이나마 중국어 발음을 문자로 재현해 내고 있는가? 중국어의 병음이란 것도 워낙 소리글자의 문자로 풀어 내기가 어려웠기에 청나라 말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로마자를 끌어들여 얼추 비교적 정교하게 만든 것이다.
중국어 표기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것만을 문제로 삼는다. 범위를 두 언어 사이에만 국한하면 그건 분명 타당성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잘 가꾸고 다듬어 온 한국어 독음을 그대로 살려 가자는데 원칙적으로 누가 반대할까? 특히 조선족들의 경우 감성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다. 이국 땅에서 100년을 어렵사리 ‘연변’과 ‘용정’을 지켜 왔는데, 큰집 격인 한국이 마치 변심해 버린 본댁처럼 난데없이 ‘옌볜’이니 ‘룽징’이니 하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곧 세계라고 생각했던 중세 조선과 지금은 시대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구촌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일 뿐이다. 조선족 역시 이러한 관점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인명과 지명을 그렇게 표기하기로 한 것은 혼란을 막고 잘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어에만 꿰어 맞추려 하다 보면 중국어 아닌 외국어 표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明月山’을 중국인들은 ‘밍위에산’, 한국인들은 ‘명월산’, 일본인들은 ‘아끼게츠야마’ 또는 ‘메게츠짠’이라고 읽는다.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이 예에서 보듯 표기와 발음은 다르다. 단지 일정 사회 구성원끼리 그렇게 읽고 그렇게 쓰기로 한 사회적 약속을 따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카페’라고 쓰되 ‘까페’라 발음하고, ‘스페인’이라 쓰되 ‘스뻬인’이라 발음하면 되는 것과도 같다. ‘브릿지스톤(bridgestone)'이라 쓰고 모두가 ’브릳지스톤‘으로 읽고 있지 않은가? 실제 발음은 ’브릳지스토운‘이지만 말이다.
혹자는 중국인들이 저들 식으로 발음하는데 우리라 해서 마냥 그들 식을 따르기만 할 게 아니라 한국어 독음대로 쓰자고도 주장한다. 예컨대 내 이름은 ‘박정태’이다. 이런 나를 중국인들은 중국어 발음으로 ‘피아오딩타이’라고 부른다. 듣는 내가 그다지 유쾌할 리는 없다. 다만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양해하는 것뿐이다. ‘압둘 무스타파 아브라힘’이란 긴 이름을 가진 아랍인이 소통의 편의상 스스로 ‘알리’라고 소개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수월한 편 아닌가? 그러나 어눌한 발음이지만 공을 들여가며 날 ‘박정태 씨’라고 불러 주는 중국인도 있다.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겠는가? 길거리 중국인들이 ‘바담 풍’하든 말든 우린 ‘바람 풍’하면 되는 것이지 국제화시대에 저들과 이만한 일로 아웅다웅할 계제가 아니다.
1988년을 기점으로 우리말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대세를 따랐다. ‘상치’가 ‘상추’로 바뀌는 등 실제로 범용되고 있는 것을 많이 인정했다. 청나라 시대의 중국인과 신중국 이후의 중국인들이 쓰는 말이 같지 않듯 조선시대의 사람과 대한민국의 사람이 쓰는 말이 같지 않다. 이처럼 언어 자체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지 정해진 법률이 아니다. 그러나 표기법이란 건 적어도 바뀌기 전까지는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추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이니까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나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사람들은 읽고 쓰는데 ‘심양’과 ‘선양’을 제각기 편한대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된다. 단 공식적인 문건이나 외국인들도 함께 한 공개적인 장소에서만큼은 지켜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양'이라 표기하되 한국인끼리 얘기할 때는 '심양', 중국인과 대화할 때는 'shenyang'으로 발음해 주는 것이다. 마치 중국인들이 자기네끼리는 ‘원거화’라 얘기할지라도 외국인인 내게는 ‘밴쿠버’로 발음해 주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