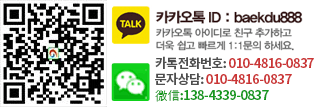[중국, 몰라도 너무 몰랐다] 벌크선 장악은 옛말, 해양플랜트도 이미 1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8 13:30본문
2000년대 중반이후 중국의 조선산업은 급부상 해 2010년 선박수주량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조선해양산업에서 연평균 30%가 넘는 급성장세를 지속했다. 2000년에는 건조량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이 불과 5.7%였지만 2009년에는 28.4%로 세계 2위로 치고 올라왔으며 2010년 이후로는 1위를 줄곧 유지해오다가 올해 한국에게 1위 자리를 내놓았다.
해양연구기관 클락슨 통계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조선산업 건조능력은 세계 전체의 39.4%를 차지했다. 한국이 29.5%, 일본이 16.8%다. 중앙정부가 대대적 지원을 하면서 3대 조선기지(발해만, 장강, 주강 유역)를 완공한 뒤 2002년 8.7%였던 건조능력은 2008년 17.1%, 2013년 39.4%로 빠르게 성장했다.
저유가 장기화·벌크선 중심 구조로 수익성 악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장기적 목표 및 정책 성과는 세계 시황 및 업체의 성장으로 기존 목표 달성 시기였던 2015년보다 5년이나 앞당겨 2010년 초기에 달성됐다.
중국의 조선해양산업이 크게 성장한데에는 중앙정부의 해운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내수시장이 안정적인 매출기반이 됐던 영향이 크다. 중국 내수규모는 2000년 약 214억 위안에서 2012년 5342억 위안으로 연평균 증가율 30.7%를 보이며 성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국가 역량이 크게 확대됐고 중국은 신조선 발주국 중 하나로 부상하며 2010년 발주규모 173억 달러를 기록,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013년에도 119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의 조선산업이 올해 들어 눈에 띠게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저유가 장기화로 중국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선 시장이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세계 선박 수주량은 전년대비 34.7% 감소한 397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였고 건조량은 전년대비 6.8% 감소한 3474만CGT였다. 원유 업체들의 과잉생산과 셰일가스 생산량의 증가로 국제 원유가격이 급락하자 지난해에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상선 뿐아니라 해양플랜트도 수주가 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
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 전세계 선박 누적 발주량은 전년대비 29%가 감소했다. 선종별로는 특히 벌크선 발주가 크게 줄었다. 벌크선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해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5년 한 해의 전세계 선박 발주량을 봐도 전년 대비 1100만CGT가 감소했으며 벌크선 발주량은 1080만CGT가 감소했다.
▲ 출처=NH투자증권
올해 중국 조선사업이 부진했던 것은 벌크선 발주량 감소와 관련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 성장했던 조선사업은 값싼 노동력으로 수주 경쟁 우위를 차지, 저부가선인 벌크선을 주력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벌크선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부진을 겪고 있으며 발주물량도 끊긴 상황이다. 이에 벌크선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선박 수주량이 전년 대비 54% 감소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2014년 38%에서 2015년 26%로 하락했다. 말레이시아 금융그룹 메이뱅크는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신규 선박수주가 둔화 돼 중국 조선산업이 2017년까지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조선 업체는 대형 국영 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CSIC), 중국선박중공(CSSC) 2개 그룹과 민영조선소가 있다. 최근 국영 조선업체들이 수익 저하로 고전하면서 전체 건조능력 활용률은 2013년 61.6%로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CSSC의 경우 조선소들을 인수하는 것으로 강도 높은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NH투자증권 역시 중국의 벌크선의 수주잔고 비중이 현재 46%로 높은 수준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성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지원 정책, 질적 성장 목표
중국은 2010년 3000여개에 이르던 조선소 중 2700여개의 폐업을 추진, 50여개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통폐합 하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 조정이 완료되면 질적 측면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정부는 조선사업의 질적 강화를 위해 수요창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존 자국 선사 위주였던 선박 수요가 해외 선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Offshore)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연구원이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가운데 가장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해운선사 노후선박 교체 지원 및 친환경 선박 유도 정책이다. 이 지원 정책들로 인해 해운부문에 운항 효율이 높아지고 조선업체의 친환경 선박 건조기술이 제고되며 기자재 부문의 친환경 기자재 개발 및 생산 확대까지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 출처=산업연구원
지난 2013년 말 중국 정부는 노후선박 해체 촉진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이전보다 대규모로 추진했다. 노후선을 해체하고 신규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중국 선사에 GT당 1500 위안(약 30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강을 중심으로 내항 바지선 약 20만척 가운데 약 7만 척을 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바지선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는 향후 LNG 벙커링 및 건조기술을 확산시키는 효과기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조선급 조선소에 건조물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내륙 운항물류의 친환경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이후에는 해양플랜트 부문에도 정책 지원을 강화했다.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3년에는 잭업 리그 시장에서 기존 강자인 싱가포르를 추월했고 이어 드릴십, FPSO 시장까지 빠르게 진입했다. 2013년 중국은 해양 관련 분야 수주실적에서 245억 달러를 기록, 한국을 추월했다. 이 분야에서도 역시 주요 업체 인수를 통해 업체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CIMC Offshore의 CIMC Raffles사를 인수했다. CIMC Raffles는 반잠수식 시추선, 드릴십, 잭업 리그 등에서 실적이 있는 싱가포르 합작 업체다.
중국 조선 업계의 해양플랜트 수주량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해양플랜트 설비 신규 수주량은 81기로 전세계 시장의 32.4%를 차지해 한국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해양작업지원선(PSV)과 해양예인지원선(AHTS) 수주량도 늘었다. 2015년에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선박 수주량이 396척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62% 점유율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주로 수주한 것은 원유 시추용 해양플랜트로 지난해 38기를 수출해 세계 시장의 60.3%를 차지했다. 총 거래 금액으로는 97억 3100만 달러로 세계 시장의 54.6%에 달한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조선업체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외고교(外高桥)와 강남(江南), 후동중화(沪东中华)와 상해(上海) 등 초대형 업체가 가동을 시작하면 중국이 세계 시장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중국 조선업계의 질적 측면이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고 각종 정책들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조선해양산업 역시 최근 크게 성장한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눈여겨 봐야 할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PC 버전으로 보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