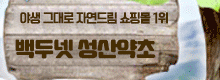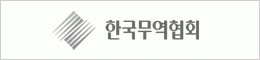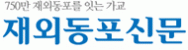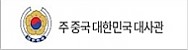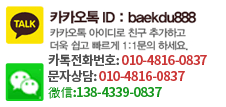아모레 '중국 큰 시장' 간파 20년전부터 준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3-14 15:39|본문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에 의해 수출되는 일명 '따이공 화장품’에 대한 평가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따이공 화장품’이란 단어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듣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2년 전부터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다. 하지만 따이공은 한국의 화장품 역사에서 보면 기록할 만한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우선 국내 종합 언론들이 ‘따이공 화장품’이란 사회적 이슈를 언제부터 다루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기만 해도 그 가치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화장품 산업 역시 ‘따이공 화장품’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한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화장품이 중국에 진출한 효시는 아모레퍼시픽이다. 한중 수교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인 20여 년 전에 이미 중국이라는 거대 화장품시장을 발견하고 준비를 했다. 여기에 2위 기업인 엘지생활건강도 바짝 뒤를 쫓았다.
당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내 인지도는 지금과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다. 따라서 이들 두 기업은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중국내에 거주하는 도매상과 소매상들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중국이라는 넓디넓고도 낯선 타국에서 화장품 도·소매상들을 물어물어 찾아다니며 만나기를 반복했다. 인지도 낮은 제품 취급을 꺼리는 이들 중국 유통업체들을 설득하고 판매를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야말로 ‘모양 빠지고 체면 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중국의 화장품 유통업체들이 생소한 한국산 화장품을 취급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 품질력 때문은 아니었다. 품질력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면 한국 화장품을 많은 모집단이 사용하고 알음알음으로 입소문을 타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유통업체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선택한 이유는 실리다. 중국 전역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잡을 수 있었고, 게다가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 공급가가 현저히 낮았다. 그 가격 차이만큼 높은 이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공들여 다져온 관계성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중국 전역 판매권과 높은 이익률, 그리고 관계성이야말로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듯 어렵사리 자리잡기 시작한 한국 화장품을 자의든 타의든 사용해 본 중국 소비자들은 다행히도 품질력 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주었다.
대한민국 화장품이 중국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 가격 대비 품질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의 화장품 유통업체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국내 화장품사들도 더 나은 유통망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내 유통업자를 교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그 과정에 법적인 다툼도 발생됐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화장품도 사치재에서 소비재로 인식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자연히 대한민국 화장품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한국 화장품사들은 우선 국내 시장이 아닌 외국에서 판매가 되면서 이익을 올릴 수 있었고, 중국 내 유통업체들은 높은 유통 이익률을 얻을 수 있어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후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교류와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또 한 번의 좋은 찬스를 맞게 됐다. 여기에다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도 한 몫을 했다. 인터넷 쇼핑몰들은 초기에는 중국내 유통업자들이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중국 내부의 사회정화 캠페인이나 더 큰 이익 추구와 맞물리면서 3년 전쯤에는 알리바바나 진둥 등 많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한국의 화장품사들과 직접 거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변화를 했다.
이들은 직거래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구매대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싱(sourcing) 열풍’이 불었다. 특히 일부 거대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본사 담당들이 직접 한국의 화장품사를 방문해 직거래를 설명하는 등 한국산 화장품 유치 붐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제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국 기업들은 국내 화장품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로 여부를 타진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한차례 열풍처럼 휩쓸고 지나가자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기존에 한국의 화장품사들이 직접 중국 유통업체들을 찾아가 팔아달라고 매달리던 공식은 어느덧 사라졌고, 거꾸로 중국에서 한국을 직접 방문해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사들은 중국을 단기적인 시장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중국의 화장품 제도와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접근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따이공 화장품’이란 단어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듣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2년 전부터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다. 하지만 따이공은 한국의 화장품 역사에서 보면 기록할 만한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우선 국내 종합 언론들이 ‘따이공 화장품’이란 사회적 이슈를 언제부터 다루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기만 해도 그 가치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화장품 산업 역시 ‘따이공 화장품’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한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화장품이 중국에 진출한 효시는 아모레퍼시픽이다. 한중 수교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인 20여 년 전에 이미 중국이라는 거대 화장품시장을 발견하고 준비를 했다. 여기에 2위 기업인 엘지생활건강도 바짝 뒤를 쫓았다.
당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내 인지도는 지금과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다. 따라서 이들 두 기업은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중국내에 거주하는 도매상과 소매상들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중국이라는 넓디넓고도 낯선 타국에서 화장품 도·소매상들을 물어물어 찾아다니며 만나기를 반복했다. 인지도 낮은 제품 취급을 꺼리는 이들 중국 유통업체들을 설득하고 판매를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야말로 ‘모양 빠지고 체면 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중국의 화장품 유통업체들이 생소한 한국산 화장품을 취급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 품질력 때문은 아니었다. 품질력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면 한국 화장품을 많은 모집단이 사용하고 알음알음으로 입소문을 타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유통업체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선택한 이유는 실리다. 중국 전역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잡을 수 있었고, 게다가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 공급가가 현저히 낮았다. 그 가격 차이만큼 높은 이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공들여 다져온 관계성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중국 전역 판매권과 높은 이익률, 그리고 관계성이야말로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듯 어렵사리 자리잡기 시작한 한국 화장품을 자의든 타의든 사용해 본 중국 소비자들은 다행히도 품질력 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주었다.
대한민국 화장품이 중국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 가격 대비 품질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의 화장품 유통업체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국내 화장품사들도 더 나은 유통망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내 유통업자를 교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그 과정에 법적인 다툼도 발생됐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화장품도 사치재에서 소비재로 인식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자연히 대한민국 화장품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한국 화장품사들은 우선 국내 시장이 아닌 외국에서 판매가 되면서 이익을 올릴 수 있었고, 중국 내 유통업체들은 높은 유통 이익률을 얻을 수 있어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후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교류와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또 한 번의 좋은 찬스를 맞게 됐다. 여기에다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도 한 몫을 했다. 인터넷 쇼핑몰들은 초기에는 중국내 유통업자들이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중국 내부의 사회정화 캠페인이나 더 큰 이익 추구와 맞물리면서 3년 전쯤에는 알리바바나 진둥 등 많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한국의 화장품사들과 직접 거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변화를 했다.
이들은 직거래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구매대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싱(sourcing) 열풍’이 불었다. 특히 일부 거대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본사 담당들이 직접 한국의 화장품사를 방문해 직거래를 설명하는 등 한국산 화장품 유치 붐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제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국 기업들은 국내 화장품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로 여부를 타진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한차례 열풍처럼 휩쓸고 지나가자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기존에 한국의 화장품사들이 직접 중국 유통업체들을 찾아가 팔아달라고 매달리던 공식은 어느덧 사라졌고, 거꾸로 중국에서 한국을 직접 방문해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사들은 중국을 단기적인 시장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중국의 화장품 제도와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접근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