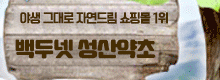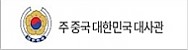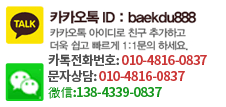다시 하얼빈, 이곳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8-06 08:23|본문
다시 하얼빈, 이곳에서
내가 다시 중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좋은 직장을 관두고 왜 또 가니.’ ‘너의 역마살은 어쩔 수 없구나.’ ‘나이를 생각해라’ 등 애정과 핀잔 섞인 충고들이 눈앞에 쏟아졌다. 그럼에도 나는 다시 비행기를 타야만 했다.
나는 4년차 기자다. 한국에서는 겁 없이 현장을 누빌, 소위 말해 날아다녀야 할 시기의 사회부 기자였다. 하지만 현장이 익숙해져 갈수록 커지는 불안감은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보장된 현대 사회에서는 인생 3모작이 가능해야 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내가 겪은 한국의 기자생활은 인생 2모작조차 불가능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4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나는 어떠한 지적 발전도 이루지 못했다. 회사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공부가 더 하고 싶었고, 좋아하는 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중국뿐이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잊을 수 없는 하얼빈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2009년이었다. 친구를 따라 베이징 여행을 갔다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뒤 중국어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마음을 먹은 지 1년도 채 안돼 나는 비교적 저렴하게 표준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말에 하얼빈을 어학 연수지로 선택했다. 게다가 나보다 7살 어린 남동생도 마침 하얼빈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공부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었다.
23살, 외국이라고는 나가본 적 없었던 평범한 대학생 시절. 하얼빈 공항에 도착해 생각보다 너무 추운 날씨에 새로 산 오리털 점퍼를 여몄던 순간이 하얼빈에 대한 첫 기억이다. 이후 하얼빈 생활에서는 마주하는 모든 것이 신세계였다. 알싸한 매연 냄새와 한동안 적응이 필요했던 향신료 향, 콧바람도 얼려버리는 추운 날씨와 러시아풍의 이국적인 거리들까지 내가 중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그 모든 것과 뒤섞여 하루 하루를 낭만으로 물들였다. 중국어 공부도 적성에 맞았다. 하얼빈 공정대학교에서 1학기 어학연수 과정을 거치며 중국인 친구들과 제법 교류가 잦았다. 같은 듯 다른 문화를 공유하며 대화하고 중국인과 중국을 알아가는 시간이 즐거웠다. 한국에서 중국어 교육을 받는 것과 비교해 눈에 띄게 빠른 발전에 신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하얼빈 생활에 즐거움만 있었다면 나는 하얼빈을 금방 잊었을 수도 있다.
한 학기를 마쳤을 때 즈음, 한국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니 귀국을 하라는 소식이었다. 할아버지 품에서 자란 나에게 ‘할아버지’는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다. 외국에 나와 있다는 핑계로 자주 안부를 전하지 못하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차였다. 비보를 들은 이틑 날 나는 한국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한 달여간을 한국에 머물며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건냈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내 나라인 한국도 낭만적이었던 중국의 하얼빈도 모두 야속해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마음을 잡고 2번째 학기를 다니기 위해 하얼빈으로 돌아온 나는 동생과 함께 향방구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처음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와 다름없는 혹독한 겨울이 다시 돌아왔고, 그 겨울만큼이나 많은 일들을 겪었다. 매일 아침 자습을 위해 7시면 등교해야하는 동생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다. 집안 살림살이는 잔고장이 왜 그렇게 잦았던지. 해결해 보겠다며 하루종일 동분서주해도 미숙한 중국어에 가슴이 턱턱 막혔다. 당시 내 생활은 마치 생존을 위한 시험같았다. 결국엔 몸에 탈이나 한 달동안 병원을 드나들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어린 나에게는 참 힘이 들었던 것 같다. 어느 순간 눈물이 핑 돌때면 한밤 중에 달을 멍하니 쳐다보곤 했다. 시린 겨울 하늘이라 달이 더 선명해 보인다고 늘 생각했었고, 이내 할아버지 생각을 했다. 할아버지에게 “잘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사실 그 시간 속에 하얼빈은 더이상 낭만의 도시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나는 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 있었다. 그리고 기자가 됐고, 하얼빈은 나를 키운 도시로 내 마음에 남게 됐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한편으로 무수한 생각들을 이겨내며 처음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느끼게 한 하얼빈. 그런 하얼빈에 대한 기억이 마치 계속해서 나를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다. 중국에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한 뒤로 기자 생활을 이어가며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백방으로 찾았다. 그동안의 인생 중 가장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떤 인연 때문인지 기회는 하얼빈에서 다시 잡을 수 있었다. 하얼빈에 본사를 두고 있는 ‘CNTV한국어방송’과 인연이 닿았고, 나는 이곳을 내생의 2번째 직장으로 정했다. 하얼빈, 나에게는 꿈같은 도시일 수 밖에 없다.
나는 지난 4월 하얼빈으로 왔다.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 돌아온 이 후 줄곧 잊었던 중국어를 되살리기 위해 중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 수업을 듣는 시간만큼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일 역시 한국과 매우 다른 환경이지만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하얼빈 생활은 7년 전 그 때만큼 신선하진 않다. 하지만 그 때보다 충만하다. 사랑하는 방송일을 계속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중국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한층 자란 나를 하얼빈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크다. 다시 하얼빈, 이곳에서 나는 23살 내가 꿈꿨던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를 상상한다. /김채영
나는 4년차 기자다. 한국에서는 겁 없이 현장을 누빌, 소위 말해 날아다녀야 할 시기의 사회부 기자였다. 하지만 현장이 익숙해져 갈수록 커지는 불안감은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보장된 현대 사회에서는 인생 3모작이 가능해야 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내가 겪은 한국의 기자생활은 인생 2모작조차 불가능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4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나는 어떠한 지적 발전도 이루지 못했다. 회사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공부가 더 하고 싶었고, 좋아하는 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중국뿐이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잊을 수 없는 하얼빈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2009년이었다. 친구를 따라 베이징 여행을 갔다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뒤 중국어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마음을 먹은 지 1년도 채 안돼 나는 비교적 저렴하게 표준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말에 하얼빈을 어학 연수지로 선택했다. 게다가 나보다 7살 어린 남동생도 마침 하얼빈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공부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었다.
23살, 외국이라고는 나가본 적 없었던 평범한 대학생 시절. 하얼빈 공항에 도착해 생각보다 너무 추운 날씨에 새로 산 오리털 점퍼를 여몄던 순간이 하얼빈에 대한 첫 기억이다. 이후 하얼빈 생활에서는 마주하는 모든 것이 신세계였다. 알싸한 매연 냄새와 한동안 적응이 필요했던 향신료 향, 콧바람도 얼려버리는 추운 날씨와 러시아풍의 이국적인 거리들까지 내가 중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그 모든 것과 뒤섞여 하루 하루를 낭만으로 물들였다. 중국어 공부도 적성에 맞았다. 하얼빈 공정대학교에서 1학기 어학연수 과정을 거치며 중국인 친구들과 제법 교류가 잦았다. 같은 듯 다른 문화를 공유하며 대화하고 중국인과 중국을 알아가는 시간이 즐거웠다. 한국에서 중국어 교육을 받는 것과 비교해 눈에 띄게 빠른 발전에 신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하얼빈 생활에 즐거움만 있었다면 나는 하얼빈을 금방 잊었을 수도 있다.
한 학기를 마쳤을 때 즈음, 한국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니 귀국을 하라는 소식이었다. 할아버지 품에서 자란 나에게 ‘할아버지’는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다. 외국에 나와 있다는 핑계로 자주 안부를 전하지 못하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차였다. 비보를 들은 이틑 날 나는 한국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한 달여간을 한국에 머물며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건냈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내 나라인 한국도 낭만적이었던 중국의 하얼빈도 모두 야속해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마음을 잡고 2번째 학기를 다니기 위해 하얼빈으로 돌아온 나는 동생과 함께 향방구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처음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와 다름없는 혹독한 겨울이 다시 돌아왔고, 그 겨울만큼이나 많은 일들을 겪었다. 매일 아침 자습을 위해 7시면 등교해야하는 동생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다. 집안 살림살이는 잔고장이 왜 그렇게 잦았던지. 해결해 보겠다며 하루종일 동분서주해도 미숙한 중국어에 가슴이 턱턱 막혔다. 당시 내 생활은 마치 생존을 위한 시험같았다. 결국엔 몸에 탈이나 한 달동안 병원을 드나들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어린 나에게는 참 힘이 들었던 것 같다. 어느 순간 눈물이 핑 돌때면 한밤 중에 달을 멍하니 쳐다보곤 했다. 시린 겨울 하늘이라 달이 더 선명해 보인다고 늘 생각했었고, 이내 할아버지 생각을 했다. 할아버지에게 “잘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사실 그 시간 속에 하얼빈은 더이상 낭만의 도시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나는 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 있었다. 그리고 기자가 됐고, 하얼빈은 나를 키운 도시로 내 마음에 남게 됐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한편으로 무수한 생각들을 이겨내며 처음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느끼게 한 하얼빈. 그런 하얼빈에 대한 기억이 마치 계속해서 나를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다. 중국에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한 뒤로 기자 생활을 이어가며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백방으로 찾았다. 그동안의 인생 중 가장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떤 인연 때문인지 기회는 하얼빈에서 다시 잡을 수 있었다. 하얼빈에 본사를 두고 있는 ‘CNTV한국어방송’과 인연이 닿았고, 나는 이곳을 내생의 2번째 직장으로 정했다. 하얼빈, 나에게는 꿈같은 도시일 수 밖에 없다.
나는 지난 4월 하얼빈으로 왔다.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 돌아온 이 후 줄곧 잊었던 중국어를 되살리기 위해 중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 수업을 듣는 시간만큼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일 역시 한국과 매우 다른 환경이지만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하얼빈 생활은 7년 전 그 때만큼 신선하진 않다. 하지만 그 때보다 충만하다. 사랑하는 방송일을 계속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중국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한층 자란 나를 하얼빈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크다. 다시 하얼빈, 이곳에서 나는 23살 내가 꿈꿨던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를 상상한다. /김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