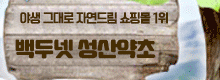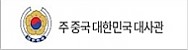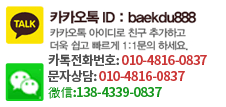연변여행 -연변 라지오 방송① 송아지 (연변延边)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 :11-11-14 12:12|본문
송아지 주인찾는 연변방송을 듣고 나는 열병을 앓았다
가 볼 수 없어 더욱 그리워했던 땅
라디오 방송 통해 호기심만 키우다 한-중 국교 수립후에야 꿈 이뤄
여섯빛깔 문화이야기
가 볼 수 없어 더욱 그리워했던 땅
라디오 방송 통해 호기심만 키우다 한-중 국교 수립후에야 꿈 이뤄
여섯빛깔 문화이야기
연변 여행은 늘 과거로의 긴 시간여행이다. 과거로 가는 길목에는 길 잃은 송아지 한 마리가 서 있다. 그것은 연변에 대한 나의 이미지요, 향수(鄕愁)다.
내가 맨 처음 연변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송아지 방송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1980년대 초 무렵인 뉴델리 아시안게임 기간이었던가 보다. 밤늦은 시간에 방송 사이클을 이리저리 맞추던 중 북한 방송 비슷한 것이 잡혀왔다. 듣고 보니 두만강 저 건너편에 있는 연변방송이었다. 그 때는 연변이라는 지명조차도 아주 낯선 이름이었다. 마침 뉴스 시간이었는데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연변 조선족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금메달을 안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 끝에 뜻밖의 방송이 흘러나왔다.
방송국에 지금 송아지 한 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주인은 빨리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리곤 송아지의 여러 특징들을 알려주고 있었다. 송아지 똥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그것은 기억 저 편에 숨어 있던 짙은 향수였다. 사람과 짐승, 농촌과 도시가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나의 이상향이었다.
'햐, 세상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연변에는 방송국에도 마구간 같은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아직도 말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까. 시골 들판 같은 곳에 있어야 할 송아지를 어떻게 도시 한가운데 있는 방송국에서 보호하고 있을까. 달구지 끄는 어미 따라 갔다가 길을 잃은 것일까. 마구간이 없다면 망나니 같은 송아지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똥도 싸고 울면서 몸부림이 대단할 텐데 방송국 정원 나무에 묶어두었을까. 코뚜레도 없는 송아지를 묶는다면 어디를 묶었을까. 다리일까, 목일까, 아니면 몸통일까…. 내 상상력은 그야말로 들판에서 송아지 쫓듯이 방향도 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 뒤로 매일 저녁 연변 '라지오' 방송에 주파수를 맞추었다.
만주에 조선족 자치주가 있다는 것, 그곳이 과거 '북간도'라는 곳이며 지금은 '연변'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에 방송과 신문 등 여러 기관이 있다는 것 등등 모든 것이 내게는 새로운 사실들이었다.
내가 들었던 그 시간대는 주로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민요풍으로 템포가 빠르고 고성이었다. 마치 옛날 유성기판을 듣는 것 같았다. '제비가 돌아왔네' '내 고향 오솔길' '살기 좋은 연변' 같은 연변가요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그 방송은 당시 우리 현실에 불만이 많았던, 그래서 이국에 대한 동경이 아주 컸었을 그 무렵인 젊은 나로 하여금 연변을 더욱 더 가고 싶은 이상과 동경의 땅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그 간드러진 듯 잔뜩 소리를 가다듬은 노래는 정말 애간장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북한 땅을 훌쩍 건너 저 머나 먼 중국 만주 땅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문화를 간직하며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산다는 것이 내게는 무한한 호기심과 상상을 유발시켰다.
하지만 당시 한국 사람으로서는 적성국인 중공(中共)에 갈 수 없었다. 향수는 점차 열병으로 바뀌었다. 연변을 다녀왔다는 독일인 신부를 찾아 왜관까지 갔었다. 독일인 신부는 과거 해방 전 연변 성당에 있었는데 그때의 신도들을 눈물로 상봉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구에 있던 화태(사할린, 연해주)교포 연락 사무소도 찾아가 연변 쪽에서 온 여러 편지 사연을 수집하기도 하면서 일본인으로 위장해 연변을 방문하는 소설까지 썼다. 소설에서는 두고 온 혈육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 찾아가는 내용이었다. 그야말로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뒤로도 연변에 대한 나의 열병은 계속되었고, 열병은 꿈속에 갇혀 울고 있는 송아지의 이미지였다. 그 송아지는 양국의 교류가 자유로워진 1990년대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현실의 세계로 나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