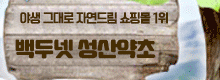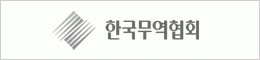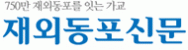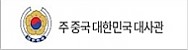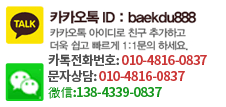한국과 중국 조선족의 언어, 문자사용에서의 차이(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1-23 09:37|본문
‘통째’와 ‘통채’
나누거나 덜거나 헤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전체를 한국에서는 ‘통째로’라 하고 중국의 조선족들은 ‘통채로’라고 한다. 한국 국어사전에는 ‘통채’를 “1 통째의 잘못. 2 통째의 북한어”라고 하였다. ‘통째’와 ‘통채’는 모두 순수한 우리말의 고유어 단어이지만 한국과 중국의 조선족들 사이에는 발음과 문자표기가 다르다.
‘담력’과 ‘담량’
겁이 없고 대담하고 용감한 기운이나 기백을 나타내는 것을 한국에서는 쓸개 ‘담[膽]’자에 힘 ‘력[力]’자를 써서 ‘담력[膽力]’이라 하고 중국의 조선족들은 쓸개 ‘담[膽]’자에 량(양) ‘량[量]’자를 써서 ‘담량[膽量]’ 이라고 한다. ‘담력’이란 단어는 한국어사전이나 조선말대사전에 모두 있지 만 ‘담량’은 없다. 중국의 조선족들이 ‘담량’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한어의 영향을 받아 한어의‘膽量’을 한자어로 하여 ‘담량’이라고 부르고 있다. ‘담력[膽力]’이나 ‘담량[膽量]’은 모두 같은 뜻의 한자어 단어이지만 한국과 중국의 조선족들은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천시’, ‘멸시’와 ‘기시’
‘천시[賤視]’, ‘멸시[蔑視]’, ‘기시[歧視]’는 모두 천할 ‘천[賤]’, 업신여길 ‘멸[蔑]’, 갈라질 ‘기[歧]’자에 볼 ‘시[視]자를 쓴 한자어 단어로서 업신여겨 낮게 보거나 천하게 여겨 깔보는 뜻의 동의어인데 중국의 조선족들은 ‘민족기시’, ‘종족기시’등 단어를 쓰지만 한국어사전에나 조선말대사전에는 다른 뜻으로의 ‘기시’란 단어는 있어도 천시하다, 멸시하다의 뜻으로는 ‘기시[歧視]’란 단어가 없다. 중국의 조선족들이 ‘기시’란 단어를 쓰는 것은 한어의 영향을 받아 한어의‘歧視’를 한자어로 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내’와 ‘인차’ 그리고 ‘금방(방금)’
한국어사전에는 ‘이내’를 “1 그때에 곧. 또는 지체함이 없이 바로. 2 어느 때부터 내처. 3 멀지 않고 가까이 곧.”이라고 해석하였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이런 뜻에서 구두어에서는‘인차’, ‘인츰’, ‘이내’란 단어를 모두 쓰고 있는데 표준적으로 서면어에서는 ‘인차’란 단어를 쓰고 있다. 한국어사전에는 ‘인차’를 ‘이내’의 북한어라고 하였고 ‘인츰’을 ‘이내’의 함경남도 방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사전에는 ‘금방(방금)’을 “1 말하고 있는 시점(時點)보다 바로 조금 전. 2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3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라고 해석하였는데 ‘금방(방금)’이란 단어를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다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조선족들은 해석 1 의 경우에만 ‘금방(방금)’의 단어를 쓰고 해석 2 와 3의경우에는‘금방(방금)’의 단어를 쓰지 않는다. 즉 과거형으로만 ‘금방(방금)’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현재형, 미래형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삐다’와 ‘풀치다’
발목이나 손목, 허리나 목, 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따위의 뼈마디가 접질린 것을 한국에서는 ‘삐다’라고 말하고 중국의 조선족들은 ‘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지만 대부분은 ‘풀치다’라고 말한다. 한국어사전에는 ‘풀치다’를 북한어라고 하였다.
‘부수다’와 ‘부시다’ 그리고 ‘마스다’
단단한 물체를 여러 쪼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거나 만들어진 물건을 두드리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드는 것을 한국에서는 ‘부수다’라고 말하고 중국의 조선족들은 ‘마스다’혹은 ‘부시다’라고 말한다. 한국 국어사전에는 ‘부시다’를 “1 ‘부수다’의 잘못. 2‘부수다’의 북한어.”라고 하였으며 한국에는 ‘마스다’란 단어가 없이‘마스다’를 북한어라고 하였다.
[에피소드]
어느 언론인, 지성인들의 모임이였다. 필자가 우리 조선족은 소수민족이지만 중국에서 민족기시를 당하여 본적이 없지만 유감스럽게도 고국에 와서 일부 하류계층의 고용주들에게서 기시를 받고 있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 있는 한국인들이 기시라는것이 무슨 뜻인가고 물었다. 그러자 중국의 한 언론인이 천시, 멸시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말하자 한국인들은 기시란 말을 처음 듣는다고 하였다. 하여 필자는 집에 돌아와서 한국어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찾아보았는데 기시란 단어가 없었다. 이때에야 필자도 중국의 조선족들은 한어의 영향을 받아 한어의‘歧視’를 한자어로 하여 ‘기시’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것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