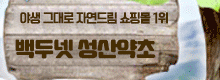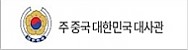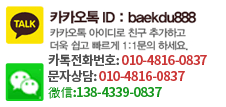재외동포 지원정책 문제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3-14 16:55|본문
재외동포 지원정책 문제 있다
세상재외동포 관련기사를 쓰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다.
엄밀히 말하면 재외동포는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다수 동포들은 생김새와 언어, 생활습관까지 한국인이다. 뿌리가 한국인인 그들을 외국인으로 치부하기엔 뭔가 찜찜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거나 더러는 한국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멀리 있는 재외동포가 지역사회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우리 대신 국위를 선양한 것 같아 자랑스럽다. 그럴 때는 외국인이라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는다. 실제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타인을 ‘여권발급국’으로 나누기보다 생김새나 혈통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모양의 여권을 쓰지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색하다. 속된 말로 ‘확 땡기는 기분’이 안 든다. 그보다는 다른 나라 국민인 재외동포들이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
그런데 얼마 전 재외동포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재외동포인 지인에게서 ‘다문화가정’의 범주에 포함돼 국가 지원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지인의 남편은 한국인, 지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두 부부는 최근 지방의 한 도시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한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부인이 ‘미국인’이라서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됐고 국내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이 됐다는 것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동안 재외동포를 ‘한국사람’으로 인식하던 기자는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재외동포는 한국인일까, 외국인일까. 외국인이라면 ‘한인’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생각이 길어지다 보니 못난 마음도 튀어나왔다. ‘밖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뿐인데 외국 여권 소지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준단 말인가?’
온라인에서 국내의 재외동포들을 욕하던 글도 떠올랐다. 그 글의 필자는 한국에서 외국여권을 가지고 사는 한인들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렀다. 외국 한 번 나가보지 못한 사람의 막연한 부러움과 시기심이 그 글 속에서 느껴졌다.
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편견없이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 넣어 국가 지원 대상에 올린 정책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한국인 부부들과 재외동포 가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재미동포와의 결혼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의 취지와는 부합하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정부지원이 많아졌다고 하나 아직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들다. 직장일에, 육아에 치여 속끓이는 내 앞자리 선배만 봐도 그렇다. 미혼인 기자가 전략적으로 결혼 상대를 골라야 하는지 고민이 시작됐다.
이지수 국제부 기자
그래서 우리는 한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거나 더러는 한국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멀리 있는 재외동포가 지역사회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우리 대신 국위를 선양한 것 같아 자랑스럽다. 그럴 때는 외국인이라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는다. 실제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타인을 ‘여권발급국’으로 나누기보다 생김새나 혈통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모양의 여권을 쓰지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색하다. 속된 말로 ‘확 땡기는 기분’이 안 든다. 그보다는 다른 나라 국민인 재외동포들이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
그런데 얼마 전 재외동포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재외동포인 지인에게서 ‘다문화가정’의 범주에 포함돼 국가 지원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지인의 남편은 한국인, 지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두 부부는 최근 지방의 한 도시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한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부인이 ‘미국인’이라서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됐고 국내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이 됐다는 것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동안 재외동포를 ‘한국사람’으로 인식하던 기자는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재외동포는 한국인일까, 외국인일까. 외국인이라면 ‘한인’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생각이 길어지다 보니 못난 마음도 튀어나왔다. ‘밖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뿐인데 외국 여권 소지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준단 말인가?’
온라인에서 국내의 재외동포들을 욕하던 글도 떠올랐다. 그 글의 필자는 한국에서 외국여권을 가지고 사는 한인들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렀다. 외국 한 번 나가보지 못한 사람의 막연한 부러움과 시기심이 그 글 속에서 느껴졌다.
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편견없이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 넣어 국가 지원 대상에 올린 정책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한국인 부부들과 재외동포 가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재미동포와의 결혼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의 취지와는 부합하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정부지원이 많아졌다고 하나 아직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들다. 직장일에, 육아에 치여 속끓이는 내 앞자리 선배만 봐도 그렇다. 미혼인 기자가 전략적으로 결혼 상대를 골라야 하는지 고민이 시작됐다.
이지수 국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