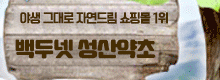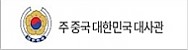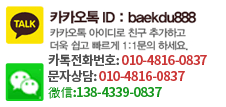조선족으로 산다는 것은 (2) 이과주로 남북을 녹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9-03 21:49|본문
간밤에 여객터미널이 엎디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여관에 묵었다.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오랴 싶어서 오랜 친구를 놓아 주듯 터미널과 그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내가 처음 연안부두를 찾은 것은 바야흐로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던 1992년 5월이었다. 그때 터미널은 낡은 건물이었고 터미널에서 신작로를 바라보면 신작로가 언덕위에 있었다. 그리고 바다와 터미널주변은 온통 까치들로 절반 하늘을 덮었다.
어릴적 고향에서는 까치 한두 마 리, 서너 마리만 보아도 운이 트인다고 손뼉까지 쳐가며 좋아했는데 여긴 온통 까치들 세상이다.
“한국이 그래서 잘 사는구나.”
그 때 스물여덟의 청년인 나의 입에서 부지중 흘러나온 말이다. 물론 지금은 인천공항이 들어서면서 조류들이 모두 제거되었을 줄로 안다.
그 때 입국심사를 받고 터미널을 빠져나오니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다. 신작로를 바라보니 당시 유행하던 체크무늬를 입은 한국인들이 덩치 큰 우산을 들고 전선줄에 매달린 제비떼처럼 줄느런히 서서 신비한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는 아직 한중수교전이고 한국 땅을 밟은 조선족이 많지 않아 일반국민들에게는 조선족이 신기하기만 할 때였다.
한편 과거 냉전시대 적성국가 국민들의 만남이기도 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물론 혹시나 하는 생각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머리에 뿌리가 없는 것이다. 후에야 안 일이지만 한국인들도 공산국가사람들은 머리에 뿌리가 나 있는 줄로 알았단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념이 다른 적성국가를 무시하고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낸 해프닝에 백성들이 놀아난 것이다.
체제가 무엇이기에 사람을 짐승취급을 하고 신념이 무엇이기에 혈육의 정마저 끊어놓았단 말인가. 차라리 뿔 달린 소나 산양을 받들어 모셨더라면 동포사이에 이런 깊은 앙금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때 나의 손에는 이과주(二锅头)한 통이 들려 있었다. 위해에서 병술을 한 박스 사서 병뚜껑을 따서 플라스틱 통에 쏟아 부은 것이었다. 반년 전에 이북에 갈 때도 똑 같이 연길에서 이과주 한 통을 들고 함경북도 무산에 간 적이 있었다. 먼 친척 되는 아저씨한테 생활형편을 물어보니 “수령님 덕분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산다.” 고 노래처럼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녁에 이과주를 쪽쪽 들이 빨던 아저씨가 다시는 ‘노래’를 입 밖에 번지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다.
이번에는 남쪽을 질러볼 차례다. 나는 위해에서 병뚜껑을 따면서 흥얼흥얼 노래까지 불렀다. (물론 요즘 ‘중국슈퍼’에서 파는 이과주는 옛날 이과주가 아님을 밝혀둔다.) 그 놈의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래라고 다르랴 싶었다. 하긴 그 때 한국에서는 대만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대만산 ‘죽엽청’을 들고 오면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선물용으로 애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때 여기 신작로에는 ‘그랜저’를 몰고 마중 나온 친척이 차에 삐딱하게 기대어 있었다. 승용차가 귀한 중국에서 온다고 한국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는 그랜저로 위세를 부려보고 기를 죽여 볼 심산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가 조금도 먹혀들지 않자 아저씨는 조금은 당황해하는 눈치다. 중학교 때 북경에 1년 남짓이 살면서 사촌매형의 덕분으로 ‘매미차’는 물론 중앙간부들만이 탈 수 있다는 ‘홍기(红旗)’표 승용차도 여러 번 타 보았는지라 ‘홍기’표만 안정성이 못한 것 같아서 슬쩍 진언했더니 친척아저씨의 얼굴 근육질이 심하게 불끈불끈 튄다.
아저씨는 강릉에 가면서 괜히 서울을 한 바퀴 돌아나오다보니 한밤중이 되어서야 강릉에 도착하였다. 이제 남은 일은 이과주의 효염을 알아볼 차례다. 야식 삼아 소반상이 들어오자 나는 아저씨한테 이과주를 맛보라고 슬쩍 권했다.
“중국술은 독하다면서.......”
아저씨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고생하면서 들고 온 성의를 봐서 한 잔 맛본다는 눈치다. 소주잔에 이과주를 찰찰 따라서 권하니 아저씨는 대신 강릉에서 생산하는 ‘경월’소주를 맛보라며 권한다. 나는 아저씨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워낙 술을 웬만히 좋아한다고 들어서 특별히 선물로 술을 택한 것이다.
60도라는 말에 먼저 안주를 집어서 씹던 아저씨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마치 술 공장의 시음사나 된 것처럼 눈까지 깜빡인다. “어?” 아저씨의 눈이 대번에 화등잔만큼 커졌다. 그리고는 대뜸 잔을 들어 나머지 술잔을 쭉 비운다.
“어?! 혀 바닥에 착착 달라붙네.”
남쪽아저씨도 드디어 ‘꿀’을 먹었다. 그 뒤로부터 나는 아저씨가 계면쩍어하며 이과주가 든 술 주전자를 건네 주면 한국소주가 좋다고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런 연고로 아저씨는 저녁마다 2잔씩 반 년 동안 ‘꿀’을 마실 수 있었다. 나도 물론 한국생활을 하면서 진작 소주를 맛들인지 오래다. 지금은 중국에 살면서도 가끔 한국슈퍼에서 한국산소주와 막걸리를 사다가 마시며 한국생활을 추억한다. (moraean@hanmail.net)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9-04 08:38:04 在中한인소식에서 이동 됨]
내가 처음 연안부두를 찾은 것은 바야흐로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던 1992년 5월이었다. 그때 터미널은 낡은 건물이었고 터미널에서 신작로를 바라보면 신작로가 언덕위에 있었다. 그리고 바다와 터미널주변은 온통 까치들로 절반 하늘을 덮었다.
어릴적 고향에서는 까치 한두 마 리, 서너 마리만 보아도 운이 트인다고 손뼉까지 쳐가며 좋아했는데 여긴 온통 까치들 세상이다.
“한국이 그래서 잘 사는구나.”
그 때 스물여덟의 청년인 나의 입에서 부지중 흘러나온 말이다. 물론 지금은 인천공항이 들어서면서 조류들이 모두 제거되었을 줄로 안다.
그 때 입국심사를 받고 터미널을 빠져나오니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다. 신작로를 바라보니 당시 유행하던 체크무늬를 입은 한국인들이 덩치 큰 우산을 들고 전선줄에 매달린 제비떼처럼 줄느런히 서서 신비한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는 아직 한중수교전이고 한국 땅을 밟은 조선족이 많지 않아 일반국민들에게는 조선족이 신기하기만 할 때였다.
한편 과거 냉전시대 적성국가 국민들의 만남이기도 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물론 혹시나 하는 생각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머리에 뿌리가 없는 것이다. 후에야 안 일이지만 한국인들도 공산국가사람들은 머리에 뿌리가 나 있는 줄로 알았단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념이 다른 적성국가를 무시하고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낸 해프닝에 백성들이 놀아난 것이다.
체제가 무엇이기에 사람을 짐승취급을 하고 신념이 무엇이기에 혈육의 정마저 끊어놓았단 말인가. 차라리 뿔 달린 소나 산양을 받들어 모셨더라면 동포사이에 이런 깊은 앙금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때 나의 손에는 이과주(二锅头)한 통이 들려 있었다. 위해에서 병술을 한 박스 사서 병뚜껑을 따서 플라스틱 통에 쏟아 부은 것이었다. 반년 전에 이북에 갈 때도 똑 같이 연길에서 이과주 한 통을 들고 함경북도 무산에 간 적이 있었다. 먼 친척 되는 아저씨한테 생활형편을 물어보니 “수령님 덕분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산다.” 고 노래처럼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녁에 이과주를 쪽쪽 들이 빨던 아저씨가 다시는 ‘노래’를 입 밖에 번지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다.
이번에는 남쪽을 질러볼 차례다. 나는 위해에서 병뚜껑을 따면서 흥얼흥얼 노래까지 불렀다. (물론 요즘 ‘중국슈퍼’에서 파는 이과주는 옛날 이과주가 아님을 밝혀둔다.) 그 놈의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래라고 다르랴 싶었다. 하긴 그 때 한국에서는 대만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대만산 ‘죽엽청’을 들고 오면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선물용으로 애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때 여기 신작로에는 ‘그랜저’를 몰고 마중 나온 친척이 차에 삐딱하게 기대어 있었다. 승용차가 귀한 중국에서 온다고 한국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는 그랜저로 위세를 부려보고 기를 죽여 볼 심산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가 조금도 먹혀들지 않자 아저씨는 조금은 당황해하는 눈치다. 중학교 때 북경에 1년 남짓이 살면서 사촌매형의 덕분으로 ‘매미차’는 물론 중앙간부들만이 탈 수 있다는 ‘홍기(红旗)’표 승용차도 여러 번 타 보았는지라 ‘홍기’표만 안정성이 못한 것 같아서 슬쩍 진언했더니 친척아저씨의 얼굴 근육질이 심하게 불끈불끈 튄다.
아저씨는 강릉에 가면서 괜히 서울을 한 바퀴 돌아나오다보니 한밤중이 되어서야 강릉에 도착하였다. 이제 남은 일은 이과주의 효염을 알아볼 차례다. 야식 삼아 소반상이 들어오자 나는 아저씨한테 이과주를 맛보라고 슬쩍 권했다.
“중국술은 독하다면서.......”
아저씨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고생하면서 들고 온 성의를 봐서 한 잔 맛본다는 눈치다. 소주잔에 이과주를 찰찰 따라서 권하니 아저씨는 대신 강릉에서 생산하는 ‘경월’소주를 맛보라며 권한다. 나는 아저씨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워낙 술을 웬만히 좋아한다고 들어서 특별히 선물로 술을 택한 것이다.
60도라는 말에 먼저 안주를 집어서 씹던 아저씨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마치 술 공장의 시음사나 된 것처럼 눈까지 깜빡인다. “어?” 아저씨의 눈이 대번에 화등잔만큼 커졌다. 그리고는 대뜸 잔을 들어 나머지 술잔을 쭉 비운다.
“어?! 혀 바닥에 착착 달라붙네.”
남쪽아저씨도 드디어 ‘꿀’을 먹었다. 그 뒤로부터 나는 아저씨가 계면쩍어하며 이과주가 든 술 주전자를 건네 주면 한국소주가 좋다고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런 연고로 아저씨는 저녁마다 2잔씩 반 년 동안 ‘꿀’을 마실 수 있었다. 나도 물론 한국생활을 하면서 진작 소주를 맛들인지 오래다. 지금은 중국에 살면서도 가끔 한국슈퍼에서 한국산소주와 막걸리를 사다가 마시며 한국생활을 추억한다. (moraean@hanmail.net)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9-04 08:38:04 在中한인소식에서 이동 됨]